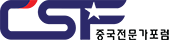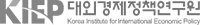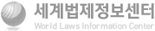전문가오피니언
Home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 민영기업의 향방: <민영경제촉진법>을 중심으로
전가림 소속/직책 : 호서대학교 / 교수 2025-04-22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중국 양회가 폐막했지만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중국 정부가 민영경제를 지속적으로 지지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 평가됐다. 금년초부터 민영경제를 촉진하겠다던 베이징 당국의 대대적인 선전 및 동원과는 달리, 민영 경제의 제도화를 위한 애초의 논의는 지금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표면적으로 중국 지도부는 민영기업을 지지한다고 밝혀왔으나, 실제 행동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경제가 어려울 때는 민영경제를 적극 활용하다가도, 상황이 개선되면 다시 억압하는 이른바 ‘국진민퇴(國進民退)’ 현상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 미통과가 중국 공산당 내에서 민영경제 발전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을 드러내는 정치적 신호라고 분석한다. 중국 공산당의 당장(黨章)을 보면, 민영기업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그 규모를 제한하며, 최종적으로는 자본을 개조, 즉 소멸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마오쩌둥(毛澤東)시대부터 공산당은 민영 자본을 철저히 경계했으며, 궁극적인 목표는 ‘자본의 소멸’이었다. 따라서 민영기업가들이 중국 공산당에 기대를 갖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며, 순진한 환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등장한 후, 미·중 전략 경쟁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기술 수준은 거의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7)으로 대표되는 기업들이 있다. 그러나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의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은 기술·경제·지정학적 영역에서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며 양국 간 경쟁 구도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
물론 중국 정부가 최근 AI 기술인 ‘딥시크(DeepSeek)’를 대대적으로 선전하며 미국과의 기술 경쟁을 강조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중국의 딥시크는 미국의 기술을 응용한 ‘미세 혁신’에 불과하며, 중국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체제가 아닌 민간 자본과 시장의 힘에 의해 발전한 예외적 사례라는 것이다. 중국이 인공지능 산업에 과도하게 투자할 경우, 일자리 감소와 경제적 부담이 커져 마치 과거 소련이 미국과의 군비 경쟁으로 무너졌던 ‘신(新) 스타워즈’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되고 있다.
미·중 기술 경쟁이 ‘국운(國運)의 전쟁’으로 격화되고 있지만, 미국은 AI와 제조업의 첨단화를 통해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동적 제로코로나’와 같은 정책 실패로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국 미국이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중국과의 기술적·경제적 거리를 유지하며, 자체 역량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반면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 민영기업은 기술 혁신과 경제 활력 그리고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의 핵심 주체로 부상했고 중국 정부도 이를 국가 전략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민영기업 좌담회
미·중 무역전쟁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2월 17일,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고위급 민영기업 좌담회를 개최했다. 마윈(馬雲, 알리바바),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레이쥔(雷軍, 샤오미), 량원펑(梁文鋒, 딥시크) 등 주요 민영기업가들이 참석한 이 회의는 경제, 기술, 정치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정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질적 개혁 부족과 권위주의 통제의 지속은 회의의 효과를 제한하며, 민영기업의 신뢰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도 한계를 드러냈다.
이번 좌담회의 배경에는 복합적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미·중 무역전쟁은 좌담회의 핵심 배경이었다. 트럼프의 관세(2025년 2월 10%, 3월 20%, 4월 104%→125%→145%)는 중국 수출 경제를 위협하며,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었다. 중국은 34%의 보복 관세와 희토류 규제로 대응하며 84%의 맞불관세도 불사했으나, 글로벌 공급망 혼란으로 경제 압박은 더욱 심화됐다. 마윈의 2018년 경고처럼 무역전쟁은 기술과 가치 사슬의 싸움으로 확장되었고, 민영기업의 혁신과 시장 경쟁력은 이를 완화하는 열쇠로 여겨졌다.
둘째, 중국 내부적으로도 부채 증가, 부동산 시장 침체,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가 지속됐다. 중국의 민영기업은 세수 50%, GDP 60%, 고용 80%를 담당하며 경제 안정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좌담회는 민영기업을 활성화해 사회적 불안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반영했다.
셋째, 기술 경쟁은 민영기업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미국의 제재(2020년 33개 기업 제재)로 딥시크, 유니트리 테크(Unitree Tech) 같은 민영기업의 AI와 로봇 기술이 주목받았다. 시진핑은 이들을 초청해 기술 자립을 촉진하려 했고 동시에 관련 분야에서의 민영기업의 잠재력도 확인했다.
넷째, 마윈의 탄압(2020년 앤트그룹(Ant Group) IPO 중단, 2021년 182억 RMB 벌금)과 부동산 헝다그룹 붕괴(쉬자인(許家印) 체포), 기업인 쑨다우(孫大午)와 런즈창(任志強) 등의 수감으로 민영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된 상태에서1)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했다는 점이다. 마윈의 귀국과 좌담회 참석, 시진핑의 “그간 잘 지내나?” 발언은 신뢰 회복과 국제적 투자 이미지 개선 및 민영기업에 대한 유화적 제스처로 평가된다.
다섯째, 내부 정치적 고려도 작용했다. 리커창(李克强) 전 총리의 “지탄경제(地攤經濟)”2) 억제에서 보듯 당내 경제 노선에 대한 갈등이 존재했었으나, 시진핑은 민영기업 지지로 파벌 갈등을 완화하고 리더십을 강화하려 했다는 점이다. 이는 대내외적으로 시진핑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경기부양)와 더불어 견고한 국정(권력) 장악력을 재차 확인시켰다.
그러나 좌담회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새로운 정책이 없었고, 공공의 관심은 정책보다 “누가 참석했나”에만 집중됐다. 좌담회는 권위주의 체제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재확인했을 뿐이었다. 좌담회 이후, 알리바바와 텐센트, 샤오미 주가는 일시 상승했으나, 2월 18일 A주 시장은 4,600여 종목 하락과 딥시크 등 테마주(概念股)의 약세로 실망감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시장 반응은 기대 이하였다. 또한 바이두(百度)의 CEO 리옌홍(李彥宏)과 징동(JD)의 류창둥(劉強東)의 불참으로 관련주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정책 신호와의 불균형이 지적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좌담회는 민영기업을 활용해 경제, 기술, 사회 안정 목표를 추구하려는 시도였으나, 권위주의 체제와 법치 및 투명성의 부재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국제적으로는 외자 유치 이미지를 개선했으나, 무역전쟁과 기술 디커플링(decoupling)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민영기업은 미·중 경쟁의 핵심 자산이지만, 체제 변화 없이는 불확실성 속에서 운영될 수밖에는 없다는 인식만 확산됐을 뿐이다.
시진핑은 왜 “민영기업을 일관되게 지지한다”고 강조했을까?
2025년 3월 2일 중국 관영 <신화망(新華網)>은 시진핑 주석의 “나는 일관되게 민영기업을 지지해왔다”는 발언을 강조하며 그의 민영기업 지원 이력을 조명하는 기사를 게재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3) 기사는 시진핑이 ‘2007년 4월 상하이(上海) 당서기로 부임한 지 한달 만에 바오산구(寶山區)를 방문해 조사한 사례’와 ‘2016년 3월 전국 정협(政協) 12기 4중전회에 참석한 민건(民建) 및 공상연합(工商聯)의 위원들을 방문한 활동’까지 시진핑의 민영기업 관련 행보를 다루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17일 시진핑이 드물게 민영기업 좌담회를 주재한 이후, 공식 매체가 다시 한번 중국 공산당 최고 지도자의 민영기업에 대한 지지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그렇다면 시진핑은 왜 이 시점에서 “일관되게 민영기업을 지지해왔다”고 강조한 것일까?
시진핑이 201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로 취임한 이후, 중국 경제가 점차 ‘국진민퇴(國進民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할 필요가 있다. 즉, 국유기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한 반면, 민영기업이 직면한 생존 환경은 점점 더 혹독해졌다. 코로나19 이전, 중국 경제의 주요 이슈는 ‘민영경제 퇴출론(民營經濟離場論)’과 ‘신공사합영론(新公私合營論)’이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여러 민영기업들이 다양한 정도의 탄압을 받았다는 점도 주지해야 한다. 2012년 집권 이후 ‘국진민퇴’ 기조와 마윈, 쑨다우 같은 기업가에 대한 탄압은 시진핑의 이와 같은 발언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시진핑이 반복적으로 민영기업을 ‘지지한다’고 표명한 배경에는 복잡한 국내외적 압력도 존재한다. 현재 중국 경제는 침체에 직면해 있으며, 민영경제는 기술분야 혁신을 선도할 뿐만 아니라, 중국 전체 세수의 50%, GDP의 60%, 혁신기술의 70%, 도시고용의 80%, 전체기업 수의 90% 이상을 기록하며 중국 경제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민영기업을 ‘지지’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경제계획을 유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국의 정치·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적 압력 역시 간과할 수 없다. 현재 그리고 미래에 다가올 미국의 대중국 압박과도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금년 2월 4일 중국 상품에 기존 관세(평균 약 25%)에 추가 10% 부과를 발표했다. 중국은 2월 10일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 추가 관세 15% 및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및 픽업트럭 등에 추가 관세 10%를 발효한다고 맞대응했다. 3월 4일, 미국은 모든 중국 수입품에 추가관세 10%를 더해 총 2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중국도 농축산물에 추가관세 10~15%를 발효한다며 맞불을 놨다. 4월에 들어서자 미국의 34% 상호관세 발표에 중국 역시 추가 34%의 맞불 관세 부과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관세전쟁은 지속적이고 무의미한 상승 국면에 접어들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새로운 관세 조치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명하며 중국은 “자국의 정당한 이익을 확고히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 위협하기도 했다. 4월 10일, 미국이 대중국 상호관세를 84%에서 125%로 재산정하며 총 누적 관세가 145%에 이르게 되자, 중국도 84%의 관세를 발효하며 대미 총 누적 관세는 125%로 인상(12일 발효)됐다. 4월 12일 <신화사>는 중국 경제가 현재 “난관을 극복하고 파도를 해쳐 나가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중국은 ‘국진민퇴’라는 배경속에서 민영기업에 대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는 여전히 실제 행동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음은 분명하다.
중국 공산당의 전략방침과 현실의 괴리: 역사와 이념적 고찰
2025년 양회가 폐막했지만 민영경제 발전의 중요 지표로 인식되었던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은 결국 통과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의 <당장>은 자본의 소멸을 궁극적인 목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4) 다만 자본 소유자들은 개혁개방의 관성과 사회주의에 대한 일방적인 기대를 놓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양회 이전, 시진핑 국가주석은 민영기업가들과의 좌담회에서 “당과 국가는 민영경제 발전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을 사회주의 체제에 편입시켰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실현할 것”이라 밝혔다.5) 양회 기간 중 리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민영경제 환경 개선을 위해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6) 그리고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 보고서> 또한 2025년까지 사회주의 시장경제 법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민영경제촉진법>, <국가발전계획법>, <금융법> 등을 제정하고 <부당경쟁방지법>과 <기업파산법>, <은행감독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 밝힌 바도 있다.7) 그러나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가 폐막하면서 몇 가지 결의안과 업무보고는 통과되었지만 <민영경제촉진법> 초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실 중국 공산당사(史)에서 경제 노선은 여러 차례 권력 투쟁을 촉발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권력투쟁의 불씨”로 표현하기도 한다. 따라서 금년 양회를 전후해 주요 이슈가 된 ‘민영경제’가 갑자기 소멸된 것은 매우 강력한 정치적 신호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중국 공산당 파벌 내부에서 ‘민영경제’라는 노선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존재한다는 의미다.
시진핑 집권기에 민영경제를 지지한 리커창 전 총리가 ‘노점경제(지탄경제)’를 추진하려다 곧바로 억압당했고, 결국 시진핑의 ‘국진민퇴(국유기업 확대, 민영기업 축소)’로 회귀하며 ‘공동부유’를 강조한 바 있다. 사실 시진핑은 지금까지 민영경제를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거나 부양한 적이 없다. 다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민영경제를 끌어올리고 경제가 회복되면 다시 억제하는 패턴을 반복해왔을 뿐이다. 그가 대기업 ‘홍이대(紅二代, 공산당 고위 간부 자녀)’ 출신 기업가들을 부패 협의로 처벌(숙청과 투쟁)해 온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8)
2012년부터 시작한 시진핑의 반부패 사정은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하지만 정치적 반대자와 독립적 영향력을 가진 기업가를 억제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는 점에서 ‘반부패 사정의 이중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한편 민영기업은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이지만 당의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민영기업의 딜레마’가 존재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사법 체계는 당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재판의 투명성도 부족하다는 점에서 ‘법적 불확실성’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인들에 대한 수감과 기업 국유화는 민영기업의 자율성을 악화시키고 국가 주도 경제를 강화로 귀결되었다는 점도 ‘당(黨)의 경제적 통제 강화’가 중국 경제의 특징적 요소인 동시에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 그리고 마오쩌둥이 자본에 대해 가진 태도 등은 <공산당 선언>에서 이미 상당히 명확하게 드러나 있고, 그 목표는 “자본을 소멸시키는 것”이란 점이다. 그러나 민영 기업가들와 외부인들은 여전히 환상을 품고 있고 새로운 봄과 발전의 절정을 맞이할 것이란 환상에 빠져 있을 뿐이다. 이러한 환상은 우선 자본을 근시안적 시각에서 공산주의의 장기적인 목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기인한다. 아울러 자본 소유자들이 중국 공산당과 공산주의에 대해 일방적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개혁개방 이후 시장 시스템과 체제와의 관계를 설명한 ‘조롱경제(鳥籠經濟)’에서 시장과 사회주의를 병존 혹은 병립하는 관계로만 파악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47년 국공내전에서 공산당이 우위를 점했을 때,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서신에는 신중국 건설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자본을 소멸시키는 것”임을 밝혔다. 이는 공산당이 처음부터 자본가를 궁극적으로 제거하야 할 대상으로 간주했음을 증명한다. 그리고 1949년 9월 중국 공산당이 통과시킨 <공동강령>에서도 자산계급의 소멸을 명시했다. 류사오치(劉少奇)는 ‘텐진연설(天津講話)’에서 “자본가가 더 많이 착취할수록 좋다”고 말했지만 문화대혁명 이후 이러한 견해는 4인방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특정 시기 정책과 공산주의의 장기 원칙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하며 이러한 약속은 대체로 신뢰할 수 없다는 증거다.
중국 공산당은 모든 민영기업과 자본가에 대해 ‘이용’, ‘제한’, 그리고 ‘개조’란 원칙을 적용한다. 우선 공산당은 자본가를 결코 자기 사람으로 보지 않고, 제한하고 이용하며 개조한다. 여기서 ‘개조’는 철학적 의미에서 ‘소멸’을 뜻한다. 이러한 이용과 제한 그리고 개조는 중국 공산당의 민영기업과 기업가에 대한 ‘전략적 방침’일뿐만 아니라. 특정 시기의 ‘전술적 방침’도 포함한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은 이러한 목표 사이에서 때론 동요하기도 하는데 이는 형이상학적으로 자본을 소멸시키려 하면서도 민영기업에 일정한 발전 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현실적 딜레마 때문이다.
금년 양회에서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에 대해 베이징 중국기업연구원의 선임연구원 탕다제(唐大杰)는 <민영경제촉진법>의 복잡성으로 인해 보다 세부적 내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4월 혹은 6월 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9) 하지만 시진핑과 주요 정부 인사들은 민영경제 포용에 대해 여전히 관망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대체로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 근거로 독재국가에서 의회와 시민사회의 자율성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중국의 정책과 법률이 통과되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추가적인 완성이 필요해서라고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상 중국이 정책이나 법률을 강제로 추진하려 할 때는 민주 사회처럼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공개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 관료 체제에서 대부분의 관리들이 여전히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현 공산당 지도부가 표면적으로 민간 사회의 활력을 촉진하겠다고 외치고는 있지만 그들은 시진핑이 민영경제를 진정성 있게 포용할 리가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관리들은 여전히 상부의 의중을 파악하고 자신이 정치적 숙청과 반부패의 표적이 되지 않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역대 지도자들은 공산주의 목표를 결코 숨기지 않았으며, <헌법>과 <당장>에 공산주의의 실현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고 이는 결코 변한 적도, 변할 수도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시진핑은 여전히 마오주의 이데올로기(Maoism)를 고수하고 있기에 이제와서 그가 일관되게 민영기업과 민영경제를 지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중 전략 경쟁 속 중국 민영기업의 역할과 영향력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 민영기업의 역할과 영향력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 딥시크 등 중국의 주요 민영기업들은 AI, 5G, 반도체 및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주도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딥시크는 2025년 R1 모델을 통해 미국의 OpenAI와 유사한 성능을 저비용으로 구현하면서 중국의 기술 잠재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했다. 민영기업들은 효율적인 알고리즘과 오픈소스 전략을 활용하여 자원 제약 속에서도 높은 성과를 내며, 미국의 자본 중심적 AI 개발 모델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민영기업의 역할은 기술 혁신뿐 아니라 중국 경제 활성화에도 필수적이다. 현재 민영기업은 중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중추적 존재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고 중국 국내 경제가 부채 문제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민영기업의 경제적 활력은 중국 정부에게 중요한 안정 요소가 되고 있다. 이들은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과 경쟁하면서 중국의 글로벌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도 기여하고 있다.
또한 민영기업은 중국의 지정학적 소프트파워 확대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화웨이는 5G 기술을 활용하여 ‘일대일로’ 국가들에 기술 인프라를 공급함으로써 중국의 지정학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딥시크는 오픈소스 AI 모델을 개발도상국에 무상 제공하며 중국의 기술 리더십과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려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텐센트의 위챗(Wechat), 바이트댄스의 틱톡(Tiktok)과 같은 플랫폼은 중국의 문화적, 이념적 메시지를 글로벌 사용자에게 전파하면서 소프트파워를 증대시키고 있다.
한편, 민영기업의 기술 발전은 안보 및 군사적 잠재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 하에서 딥시크의 AI 기술과 화웨이의 5G 인프라는 군사 인텔리전스와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군사적 응용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 기업들이 보유한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는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과 같은 국가 감시 체제 강화에 이용되며, 미국의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국 민영기업은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기도 하다.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정책 불확실성은 민영기업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억압하여 혁신 잠재력을 제한하고 있다. 마윈의 앤트그룹 IPO 중단과 벌금 부과 사건은 민영기업가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확산시켰으며, 딥시크와 화웨이의 데이터 보안 논란은 국제적 신뢰도를 훼손하여 서구권 시장 진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로 인해 첨단 칩(chip) 접근이 제한되면서 기술 발전에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도 하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민영기업을 경제 활성화, 기술 패권 확보, 지정학적 영향력 확대 및 사회적 안정 유지라는 다차원적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5년 시진핑 주석의 민영기업 좌담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민영기업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외자 유치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전략적 목적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그러나 정부가 민영기업의 혁신과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고 통제를 지속한다면 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 확보는 어려워질 것이다.
중국의 민영기업은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중국의 기술 혁신과 경제적, 지정학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주체로 부상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권위주의적 통제와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혁신 잠재력은 장기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민영경제촉진법>과 같은 법치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근본적 개혁 없이는 중국 민영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요원할 것이다.
---
*각주
1) 물론 이전에도 우샤오후이(吳小暉), 녠광지우(年廣久) 등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있기도 했다.
2) 길바닥에 자판을 깔거나 포장마차와 같은 이동식 행상도구를 이용해 길거리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으로 코로나가 창궐하던 2020년 6월 리커창 총리가 서민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포장마차 영업 등을 공식적으로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며 주장한 것. 리오프닝 이후 중국 경제가 회복은 커녕 불황이 심화되자 중국 정부는 다시 “지탄경제”를 들고 나오기도 했다.
3) 新華社, ““我是一貫支持民營企業的”—習近平同志關心推動民營經濟發展紀實”,2025. 3. 2,http://www.news.cn/politics/leaders/20250302/bb9bae7033e949d28b9d34f691bb3a7b/c.html (최종 검색일: 2025. 3. 30.)
4) 중국 공산당은 공식적으로 ‘자본 소멸’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념의 핵심 원칙 중 하나는 사유재산과 자본주의 체제의 종식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다. 필자는 중국 공산당이 이념적으로 자본 소멸을 궁극의 목표로 삼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제발전과 체제 안정을 위한 실용적인 정책을 우선시한다는 점을 인정하나, 다만 이에 대한 운영과 정책적 우선 순위에서 체제와 공산당이 우선한다고 본다.
5) 新華社,“習近平在民營企業座談會上強調:民營經濟發展前景廣闊大有可為 民營企業和民營企業家大顯身手正當其時”,2025. 2. 17.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2/content_7004103.htm (최종 검색일: 2025. 4. 3.)
6) 新華社,“政府工作報告”,2025. 3. 12.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3/content_7013163.htm (최종 검색일: 2025. 4. 2.)
7) 新華社,“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工作報告”,2025. 3. 14. https://www.gov.cn/yaowen/liebiao/202503/content_7013545.htm (최종 검색일: 2025. 4. 1.)
8) 중국에서 민영기업인들이 부정부패 협의로 수감된 사례는 중국 정부의 반부패 캠페인과 권력 통제의 복잡한 맥락 속에서 자주 등장한다. 2020년 마윈이 중국 규제 당국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후, 앤트그룹은 370억USD 규모의 IPO가 중단되었다. 그 후 그는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다. 2021년 알리바바는 <반독점법> 위반으로 182억RMB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마윈은 직접 수감되지는 않았으나 그의 활동은 크게 제한되었다. 마윈은 해외 체류 후 2023년 귀국했다. 농업 대기업 대우그룹(大午農牧集團)의 창업자인 쑨다우(孫大午)는 2020년 11월 토지분쟁과 관련해 체포되었고 2021년 불법 모금, 군중 소집, 공무 방해 등 협의로 18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그의 가족과 임원 20여 명도 체포되었다. 부동산 재벌 런즈창(任志強)은 2020년 3월 코로나19 대응을 비판하는 에세이를 발표한 후 실종되었고, 동년 9월 부패, 뇌물수수, 공금 횡령, 권력 남용 등의 협의로 18년 징역을 선고 받았다. 안방보험(安邦保險) 회장 우샤오후이(吳小暉)는 2018년 사기 및 횡령 협의로 18년 징역을 선고 받았고, 수감 후 그의 기업은 국영 기업에 흡수됐다. 1980년대 성공한 민영기업가 녠광지우(年廣久)는 부패 및 국유재산 횡령 협의로 체포되었다. 중급 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되었으나, 1990년 ‘부도덕한 관계’ 협의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기업은 결국 문을 닫았다.
9) South China Morning Post(SCMP), “Further tweaks expected to China’s draft private sector promotion law”, 2025. 3. 11. https://sc.mp/rs08w?utm_source=copy-link&utm_campaign=3301936&utm_medium=share_widget (최종 검색일: 2025. 4. 3.)
| 이전글 |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 2025-04-22 |
|---|---|---|
| 다음글 |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으로 본 중국 정치와 외교 |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