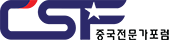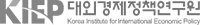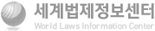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서구권] 트럼프 ‘관세 위협’에 중국·인도 5년 만에 화해 모드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8-22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과 인도는 1962년 국경 전쟁 이후 지속된 영토 분쟁과 2020년 갈완 충돌로 관계가 최악에 달했으나 경제적 상호의존성은 유지해왔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인도 관세 위협으로 미국과 인도 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과 인도 양국은 2024년 10월 브릭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나섰음. 2025년 들어 고위급 외교 교류 재개, 직항편 복원, 국경 무역 재개 등 실질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으나 구조적 불신과 국익 충돌로 인한 한계는 여전히 존재함.
◦ 기존 중국-인도 관계는 경쟁과 협력의 이중 구조
- 인도와 중국은 세계 1, 2위 인구 대국으로 아시아 지역 패권을 두고 경쟁해왔음. 1947년 인도 독립 이후 초기에는 우호 관계를 유지했으나, 1950년 중국의 티베트(Tibet) 점령으로 인도와 직접적으로 국경이 맞닿게 되면서 갈등이 시작됨. 1959년 달라이 라마(Dalai Lama) 망명 사건과 1962년 히말라야(Himalayas) 국경 전쟁을 거치며 아크사이친(Aksai Chin)과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지역 영토 분쟁이 미해결 상태로 남게 됨.
- 2017년 부탄(Bhutan) 접경 도클람(Doklam) 지역 대치 사건을 거쳐 2020년 라다크(Ladakh) 갈완(Galwan) 계곡 무력 충돌로 양국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음. 인도는 중국인 관광비자 발급 중단, 화웨이(Huawei) 5G 장비 도입 금지, 틱톡(TikTok) 등 중국 앱 차단 조치를 시행함. BYD와 GWM(Great Wall Motor)의 각 10억 달러(약 1조 3,937억 원) 투자 계획도 승인을 거부함.
- 한편, 정치적 갈등과 별개로 경제 관계는 지속 확대됨. 중국은 미국에 이어 인도의 제2위 교역 상대국으로, 2024년 양국 교역액은 1,270억 달러(약 176조 9,491억 원)를 기록함. 그러나 중국의 대인도 수출이 1,090억 달러(약 151조 8,697억 원)로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며 인도의 무역수지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
- 인도는 전기·전자장비 분야에서 연간 480억 달러(약 66조 8,688억 원)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제약업계 핵심 원료인 의약품 원료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함. 전기차, 재생에너지, 소비전자 산업에 필수인 희토류 자석 역시 중국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수출 제한 시 산업 전반에 타격이 우려됨.
- 중국은 내수시장 성장 둔화로 인도를 핵심 해외 시장으로 주목하고 있음. 인도는 연간 1억 5,600만 대 규모의 스마트폰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샤오미(Xiaomi), 비보(Vivo), 오포(Oppo) 등 중국 브랜드가 시장을 주도함. 연간 430만 대 규모의 자동차 시장에서도 중국 업체들이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미국의 개입에 따른 중국-인도의 관계 변화
- 미국 트럼프(Trump) 1기 행정부는 인도를 대중 견제의 핵심 파트너로 활용했으나,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인도에도 강경 정책을 적용함.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인도 상품에 50% 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양국 관계가 급속히 냉각됨.
- 트럼프는 인도를 '관세왕(tariff king)'으로 지칭하며 무역 불균형을 비판했으나, 인도는 석탄, 의약품, 항공기 부품 등 주요 미국 수출품에 낮은 관세를 적용한다고 반박함. 인도 싱크탱크인 옵저버연구재단(Observer Research Foundation)의 외교 정책 부사장 하시 V. 판트(Harsh V. Pant)는 "트럼프의 공개적 압박 방식이 인도 내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고 분석함.
- 인도 모디(Modi) 총리는 야당의 굴복 압력에도 "농민, 어민, 낙농업자의 이익을 포기할 수 없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표명함. 이러한 미국과 인도의 갈등은 안보·기술 분야에서 구축해온 대중 견제 협력 체계를 약화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
- 중국은 역사적으로 중립적인 외교정책을 유지해 온 인도가 노선을 바꿔 미국 진영에 가담하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음. 특히 인도, 미국, 일본, 호주로 구성된 쿼드(Quad) 안보협의체는 중국 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경계 대상임. 올해 하반기 인도에서 예정된 쿼드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미국-인도의 관계 개선에 달려 있음.
- 벵갈루루(Bangalore) 소재의 비영리연구기관 탁샤실라연구소(Takshashila Institution)의 마노즈 케왈라마니(Manoj Kewalramani) 책임자는 "중국은 미국과 인도의 무역 분쟁을 보며 만족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 인도 간 신뢰 붕괴는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함. 중국 관영 매체에서도 모디 총리의 중국 방문 예정 이슈를 보도하며 이를 미국의 대중국 봉쇄 전략 실패 사례로 해석함.
◦ 중국-인도의 미국 견제 속 실용외교 재개
- 중국과 인도의 관계 개선 움직임은 2024년 10월 러시아 카잔(Kazan)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담에서 본격화됨. 모디 총리와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5년 만에 양자회담을 갖고 '상호 신뢰·존중·배려' 원칙에 합의했으며, 3,500km 국경 순찰 협정을 체결하여 군사적 긴장을 완화함.
- 2025년 들어 고위급 외교 교류도 재개됨. 수브라마냠 자이샨카르(Subrahmanyam Jaishankar) 인도 외무장관이 2020년 이후 처음 베이징(Beijing)을 방문했고, 왕이(Wang Yi) 중국 외교부장이 3년 만에 뉴델리(New Delhi)를 방문함. 중국은 인도에 대한 요소(urea) 수출 제한을 완화했고 인도는 중국인 관광비자 발급을 재개했으며 양국 직항편 복원 작업에 착수함.
- 아지트 도발(Ajit Doval) 인도 국가안보보좌관은 왕이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양국 국경에 "평화롭고 안정적인 새로운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가함. 양측은 2020년부터 중단된 직항편 조기 재개, 상호 비자 발급 간소화, 히말라야 3개 국경 통과지점 무역 재개 등에 합의함. 중국은 인도의 요청에 따라 희토류, 비료, 터널굴착기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으며, 양국은 순례 활동, 민간 교류, 국경 간 하천 데이터 공유 등 다방면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함.
- 모디 총리는 8월 31일 중국 톈진(Tianjin)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담 참석차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임. 모디 총리는 "지난해 카잔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이후 양국 관계가 상호 이익과 민감성 존중을 바탕으로 발전해왔다"고 평가함. 비영리기관 국제위기그룹(Crisis Group)의 프라빈 돈티(Praveen Donthi)는 "5년간의 긴장 이후 접촉과 경제협력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함.
- 그러나 양국 관계의 개선에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히 존재함. 상하이(Shanghai) 푸단대학교(Fudan University)의 린 민왕(Lin Minwang) 교수는 "중국이 관계 개선을 환영하지만 인도의 외교적 제스처를 위해 핵심 국익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전문가들은 현재의 협력이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따른 전술적 접근이며, 구조적 신뢰 구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함.
[참고 자료]
| 이전글 | 中 메이퇀 ‘키타’ vs 디디 ‘99푸드’, 브라질서 정면 충돌 | 2025-08-22 |
|---|---|---|
| 다음글 | 中 부동산 살리기 총력전...베이징 ‘구매제한 폐지’·상하이 ‘용도변경 허용’ | 2025-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