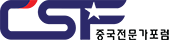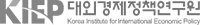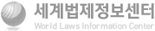전문가오피니언
Home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시대 중국 긱워커의 사회보장 확대: 제도 정비와 민관 협력의 진전
이소양 소속/직책 : 보험연구원 / 연구원 2025-09-15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문제 제기
중국은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성장과 도시화에 따라 음식 배달, 차량 호출, 물류 배송 등 플랫폼 기반의 비정형 노동자(이하, ‘긱워커(gig worker)’)가 급증하고 있다. 2021년 기준 긱워커는 1억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1), 특히 도시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은 전통적 고용계약 없이 유연하게 일하지만, 사회보험 미가입률이 높아 각종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4~2024년 긱워커 관련 민사 분쟁은 약 42만 건에 달했으며2), 중국총공회는 긱워커 다수가 산재보장 부재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3)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디지털 기반 민관협력형 보험제도를 도입하며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2. 사회보험 체계의 적용 확대
최근 중국은 기존 5대 사회보험(양로, 의료, 출산, 실업, 산재)에 대해 플랫폼 기반 노동자, 즉 긱워커의 자율가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특히 실업보험과 산재보험은 고용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이 중 산재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산재보험 체계와 별도로 신직업상해보험(新职业伤害保险) 제도가 도입되었다. 신직업상해보험은 2022년 7월부터 베이징, 상하이, 장쑤, 광둥(심천 포함), 하이난, 충칭, 쓰촨 등 7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되었으며, 2025년 3월 기준 총 17개 성·시로 확대되었다. 가입자는 약 1,2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다.4) 이 제도는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료를 “건당 수주량 × 위험계수” 방식으로 산정하여 전액 부담하며, 최대 100만 위안까지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 가입과 청구 절차는 위챗(WeChat)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간소화되어 긱워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3. 민·관 협력 기반 제도 운영
최근 중국의 대표 플랫폼 사업자인 징둥닷컴(JD.com), 메이투안(Meituan), 어러머(Ele.me)는 자사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긱워커에 대한 복지 강화에 나섰다. 징둥닷컴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전일제 배달기사에 대해 5대 사회보험 및 주택구입적립기금(주택공적기금)을 전액 부담할 것이라고 발표하며5), 이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 중에서 드물게 전일제 노동자 대상 전액 부담 방침을 공표한 사례로, 플랫폼 기반 복지 확장의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메이투안은 약 14억 위안(약 2,8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자해 약 82만 명의 활성 배달기사를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을 추진 중이며6), 어러머 또한 일부 지역에서 배달기사의 산재·건강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기반 복지 확대는 전체 긱워커(약 2억 명, 전체 노동력의 약 25%, 2021년 기준7)의 상당 부분을 기존 사회보험 체계 안으로 포함시킬 잠재력을 지닌다.
한편, 중국에서는 지방정부와 민간 보험회사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정책성 건강보험인 훼민바오(惠民保) 제도를 통해 지역 주민과 긱워커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확대하고 있다. 훼민바오는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연간 100~200위안의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 200만 위안까지 중대질병 관련 의료비를 보장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지방정부는 제도의 기획과 지침을 마련하고, 민간 보험회사는 상품의 설계·운영 및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며, 가입은 자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훼민바오는 ‘도시맞춤형 건강보험(城市定制型商业医疗保险)’으로도 불리며, 도시별로 보험 상품이 맞춤 설계되고 있다. 연령, 직업, 기존 질병 유무와 관계없이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주민이라면 누구나 건강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평균 50~150위안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보장 범위는 자비부담금 보조와 고가 특약약품까지 포함되며, 공적 의료보장만으로는 의료비 위험을 감당하기 어려운 긱워커에게도 추가적인 건강보장을 제공할 수 있는 보완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8)
이처럼 중국의 민·관 협력 기반 사회보장 확대는 두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 긱워커에게 산재보험과 5대 사회보험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민간 주도형 보호모델이며, 다른 하나는 지방정부와 민간 보험회사가 협력해 운영하는 도시맞춤형 건강보험(훼민바오)과 같은 공공-민간 연계형 모델이다. 두 모델 모두 제도 설계와 실행을 민·관이 분담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정형 노동자를 포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표 1. 중국의 신직업상해보험 및 훼민바오 비교
자료: 저자 작성
4. 법·제도 정비와 노동권 강화
2024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플랫폼 기반 긱워커에 대한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무분쟁 처리에 관한 지침(平台用工劳动争议案件审理指导意见)’을 발표하였다.9) 이 지침은 플랫폼 사업자가 긱워커에 대해 ‘지배적 관리(控制管理)’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형식상 계약 내용과 무관하게 실질적 고용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이는 기존에 법률상 사용자 지위가 불분명했던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한 판례 기준 정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요 판단 기준으로는 △업무 내용 및 방식에 대한 통제 여부, △작업시간·장소의 구속성, △일방적 벌점 및 계약 해지 권한, △플랫폼의 정산·배정 알고리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준은 긱워커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기존 플랫폼 주장과 달리, 사실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10)
해당 지침은 긱워커가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노동계약상 권리(예: 임금 체불, 부당 해고, 산재 보상 등)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노동분쟁 해결 시 근로자 보호의 우위를 명확히 한 판례 방향성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각급 인민법원에 플랫폼 노동 관련 사건의 통일적 해석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간 판결 편차를 줄이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반영되어 있다.
이번 최고인민법원의 가이드라인은 중국 내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 노동관계를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노동법·사회보장법 차원의 추가적 입법·제도 정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5. 제도 운영의 성과와 과제
중국 정부의 긱워커 대상 사회보장 정책은 제도적 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은 일정 성과를 보였지만, 실질적 보호 수준과 전국적 확산 면에서는 여전히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가입 및 보험금 청구 시스템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긱워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빠른 보상 처리와 간편한 시스템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낮은 가입률과 지역 간 제도 적용 수준의 격차가 존재한다. 일부 성·시에서만 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전국적 확산에는 한계가 있으며,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 방식으로는 제도의 보편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사회보험 비용 부담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비용을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직업상해보험의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공론화되고 있다.11)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방식의 표준화 △비고용 상태에 맞춘 유연한 납부 구조 △플랫폼 노동자 대상 정보제공 및 인식 제고 △운영성과에 대한 제도적 모니터링 체계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신뢰성과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의 명확화와 제도 설계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지적된다.12)
6.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중국은 긱워커 확산이라는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포용적 사회보장 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다. 긱워커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확대, 고용계약 외부에서의 산재보험 가입 지원, 저비용 정책성 건강보험(예: 훼민바오) 도입, 디지털 기반의 가입 및 보상 시스템 구축,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도 전반의 유연성과 포괄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형 노동자에게 현실적인 보장을 제공하고자 민·관 협력 구조를 제도 설계 전반에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중국의 사례는 급속한 디지털 전환과 노동시장 유연화 속에서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포섭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모델이다. 플랫폼 사업자가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와 보험회사가 연계되어 가입·보상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기존 사회보험체계가 포용하지 못했던 계층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데 효과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도 플랫폼 기반 노동자 및 특수고용 형태의 확산, 청년층의 시간제 근무 증가 등으로 유사한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대응은 정책적 참고 사례로 검토될 수 있다. 예컨대, 유연한 가입 구조 설계, 민·관 협력 기반의 보험 운영, 디지털 시범사업 추진, 보험료 부담 구조의 명확화 등은 플랫폼 기반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 설계 시 고려할 수 있는 요소들이다.
---
*각주
1) 중국국가통계국(2022). 『중국 디지털경제 통계공보』
2) 중국 최고인민법원(2024). 『2024년 전국 민사사건 통계연감』
3) 中华全国总工会(ACFTU). (2023). 《平台经济就业人员劳动保障状况调研报告》
4) Asia Insurance Review(2025), “China:Work injury insurance programme to cover new occupations”
5) China Daily(2025), “JD announces comprehensive insurance, housing cover for full-time delivery riders”
6) Moomoo(2025), “Meituan and JD.com are paying social insurance for riders, and the delivery Industry may face a new round of reshuffling.”
7) China Daily(2025), “Initiatives taken by e-commerce platforms JD and Meituan bring relief to thousands of delivery workers”
8) 이소양(2022), 「중국 ‘도시맞춤형 의료보험’ 최근 동향」, 보험연구원
9) China Justice Observer(2025), “SPC Issues Guiding Cases on Gig Worker Protection”
10) 中国律师网(2025), “新形势下典型劳动关系与非典型劳动关系的认定”
11) Asia Insurance Review(2022), “The Geneva Association - Gig economy work: Mind the protection gaps”
12)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2022), “Assessment of social security coverage of workers in diverse forms of employment and in platform employment in China”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중국의 AI 굴기와 미국의 수출규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 202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