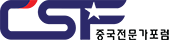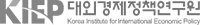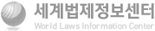시진핑: 마오쩌둥은 위인이고 ‘문혁’은 재앙이다.
양갑용 소속/직책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2016-05-19
2016년 5월 2일 인민대회당에서 ‘56송이 문공단(56朵花文工團)’ 문예 공연이 있었다. 여기에 30여 곡의 이른바 ‘혁명 가요(紅歌)’가 불려졌다. 혁명 가요, 인민대회당, 관방 주최니 민간 주최니 여러 말들이 회자되면서 ‘문화혁명’ 50주년과 맞물려 해외뿐만 아니라 중국 국내 좌, 우파 간에도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의 초점은 ‘혁명 가요’ 그리고 이것으로 촉발된 ‘문혁’ 되살아나기에 대한 폐해와 관련된 것이었다. 결국 ‘혁명 가요’를 ‘문혁’과 등치시켜 생각했다는 점에서 50년이나 지났지만 ‘문혁’은 여전히 중국에서 금기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물론 ‘혁명 가요’를 부른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문혁’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문혁’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중반 중국을 휩쓸었던 일종의 특정한 사건인 반면에 ‘혁명 가요’는 노래라는 매우 광범위한 보편적인 개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혁명 가요’가 불린다고 해서 중국의 사회조류가 다시 ‘문화혁명’ 시대로 회귀하거나 퇴보하는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명 가요’가 인민대회당에서 공공연하게 불린 것은 분명 정치적으로 여러 해석을 낳게 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 형국이기 때문이다. 즉 인민대회당과 ‘혁명 가요’가 ‘문혁’ 50주년과 맞물린 타이밍이 절묘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사건은 일종의 해프닝일 수도 있다. 그러나 덩샤오핑(鄧小平)의 “우를 경계하지만 좌를 더 방지해야 한다(警惕右, 更要防止左)”는 말에서 보듯, 우와 좌를 모두 경계하는 중공당의 현실을 잘 드러내 보였다. 또한 이는 중국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과거 문제에 대한 확실한 매듭을 짓지 않고 덮고 가야만 하는 취약한 구조를 배태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거사 문제로 미래를 옭매는 일은 매년 6월이면 반복되는 ‘천안문 사건’에서도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난 30여 년 동안 쉼 없이 개혁개방을 추진했고 그 결과 사회적 부가 폭발적으로 증대했다. 이러한 양적인 성장은 세계도 인정하고 중국 자신들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부의 축적은 이른바 중산층의 비약적인 확대를 유도했다. 서방사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민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공고하게 갖추지는 못했지만 중국의 중산층 또한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사실 이들은 개혁개방의 최대 수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다시 급진적인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거나 실제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히려 이들의 생활태도와 정치에 대한 태도와 관심은 과거로의 회귀 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에 경사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러나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 사회 모순과 갈등이 점점 구조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현실 탈출을 위한 이상향으로서 평균주의를 추구했던 마오쩌둥 시기로의 ‘심정적’ 회귀는 사회의 다원화 추세와 맞물려 완전히 부정할 수 없는 현상이 되었다. 답답한 현실에서의 돌파구를 과거로의 회귀를 통해서 극복해내고, 위안을 받고 더 나아가 대안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사회 여러 곳에서 목격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서 미래가 아닌 과거로의 회귀 경향은 그래서 중국 사회가 처한 현실에서 보면 어쩌면 당연한 현상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 모순이 격화되고, 사회의식이 일원적인 이데올로기 선호에서 다원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특히 비정상적인 사회 상태에 대한 도피처와 위안처를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마오쩌둥 시기는 비록 가난했지만 역동적이었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어려움을 미래 비전에서 찾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의 향수와 추억 속에서 찾으려는 모습은 분명 자신감의 발로는 아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와 과거로의 회귀가 잠시 현실의 고통과 간난신고(艱難辛苦)를 잊게 할 수는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내에서 ‘문혁’에 대한 찬반 논의, 문명사적 가치와 세계사적 의의 등 ‘문혁’ 관련 담론이 모두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는 자들만의 몫은 아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문혁’은 이미 중국에서 정치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회관계에 깊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주목받고 있을 뿐이다. 특히 2016년 올해 ‘문혁’이 주목받는 이유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50년이라는 주기성과 함께 시진핑의 정치적 리더십과 관련되어 있다.
마오쩌둥의 절대적인 지위와 역할, 즉 강력한 일인지배 체제의 마오쩌둥의 권위가 시진핑의 권력 강화와 오버랩 되어 회자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과연 ‘문혁’ 시기 마오쩌둥처럼 강력하고 제어할 수 없고 대체 불가능한 강력한 권위를 가지려고 하는지가 중요한 관찰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한 지도력을 확보해 가고 있는 시진핑이라 할지라도 중국공산당 중앙이 지난 1981년 마오쩌둥과 ‘문혁’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를 재해석할 정도로 정치적 리스크를 감내하려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마오쩌둥과 ‘문혁’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하면서도 마오쩌둥이 가졌던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원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시진핑의 입장에서 보면 덩샤오핑 등 원로들의 합의에 의해서 강력하게 구축되어 온 이른바 집단지도체제를 일거에 일인지배체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조기에 무모하게 진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마오쩌둥과 ‘문혁’의 교훈을 자신의 권위 강화와 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매우 보수적인 접근을 취할 것이다. 올해 50년 주기를 맞는 ‘문혁’이 매우 조용하게 지난 것도 바로 이러한 시진핑과 당 중앙의 보수적인 접근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시진핑에게 문혁은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다. ‘문화혁명’이 공식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인 1962년부터 부친 시중쉰(習仲勳)의 고초를 옆에서 지켜본 소년 시진핑에게 ‘문혁’은 분명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일 것이다. 특히 그 자신이 1969년 만 16세가 되기 전 베이징을 떠나 산베이(陝北) 농촌으로 하방 되어 토굴(窯洞)에서 벼룩과 싸워가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유년 시절은 분명 쉽지 않은 세월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성공적으로 중국의 최고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힘겨웠던 하방의 기억은 또 다른 성공의 동력이나 발판, 출발점으로 포장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문혁기간’ 시진핑은 산시성(陝西省) 옌추안현(延川縣) 원안이(文安驛) 인민공사 량자허(梁家河) 인민대대에 배속되어 약 7년여 간 기층에서 근무했다. 당시 시진핑의 첫 번째 ‘관직(官銜)’은 인민대대(행정촌) 당 지부 서기였다. 기층에서 시작된 시진핑의 관직은 산시(陝西), 허베이(河北), 푸젠(福建), 저장(浙江), 상하이(上海), 베이징(北京)으로 이어져서 신중국 성립 이후 출생한 첫 총서기가 되었다. 결국 ‘문혁’은 시진핑을 기층에서 단련시켜 기층 경험을 축적하게 한 매우 효과적인 기반이 된 셈이다. 따라서 시진핑에게 ‘문혁’은 힘겹고 고단한 지난날인 동시에 중앙으로 진출하기 위한 기층의 경험을 축적한 매우 유용한 시간이기도 했다. 따라서 ‘문혁’ 기간 지식청년으로 하방된 기층에서 시진핑은 기층의 중요성을 몸소 체득했고, 이것이 바로 지금 시진핑이 당과 국가사업 그리고 간부의 작풍에서 기층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층의 경험은 시진핑이 당과 국가사업에서 늘 강조하는 현지 조사의 중요성으로 투사되어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간부들이 현지 조사 연구를 정책결정 전 과정에서 관철해야 한다고 자주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간부들에게 “군중 속으로 들어가 광범위하게 군중 의견을 청취하고 군중이 ‘가장 기대하고, 가장 초조해 하고, 가장 걱정하고, 가장 원망하는(最盼, 最急, 最憂, 最怨)’ 문제를 꼭 틀어쥐어 놓지 말고 주동적으로 조사 연구한다”는 시진핑의 강조는 사실 그 자신의 ‘문혁’의 경험이 투영된 결과하고 할 수 있다. 또한 ‘문혁’이라는 매우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리면서도 시진핑은 오히려 농촌 생활의 실상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고 이는 향후 중국의 기본 국정을 설계하는 인생철학이 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문혁’이 시진핑 개인에게 매우 나쁜 경험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평가를 할 수도 있다.
사실 시진핑은 하방되기 전부터 매우 적극적으로 현실에 개입해 들어갔고, 특히 ‘문혁’ 기간 생존과 관련된 최일선에서의 경험은 그 자신을 매우 단호하고 비타협적인 원칙주의자의 강건한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시각도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시진핑의 인민 친화적인 작풍은 1975년 칭화대학(靑華大學) 입학이 결정되고 그 후 농촌을 떠나는 날 농민들이 ‘빈농과 하층, 중농의 좋은 서기(貧下中農的好書記)’라는 글이 새겨진 액자를 선물로 주었다는 일화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시진핑은 ‘문혁’이라는 정치적 동란 시기에도 7년의 농촌 생활을 통해서 ‘무엇이 중국의 농촌인지(什麼是中國的農村)’, ‘무엇이 인민들의 희노애락인지(什麼是老百姓的喜怒哀樂)’, ‘무엇이 중국의 기본 국정인지(什麼是中國的基本國情)’를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시진핑의 ‘문혁’ 경험은 자신의 인생을 도운 가장 큰 것은 “하나는 혁명 선배들이고, 다른 하나는 산베이(陝北) 친구들”이라는 자신의 발언에서도 나타나 있다. 결국 ‘문혁’의 경험이 시진핑에게는 오히려 군중에 대한 관심을 촉발하고 그들이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세월이었던 셈이다.
그러나 ‘문혁’의 경험이 시진핑 개인에게는 농촌과 기층, 인민을 이해하고 직접 체득하는 긍정적인 기회를 제공했을지라도 시진핑 자신이 ‘문혁’에 대한 평가를 단독으로 내릴 수는 없는 구조이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중국은 이미 1981년 <건국 이래 당의 약간의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關於建國以來黨的若幹曆史問題的決議)>를 통해서 ‘문혁’과 마오쩌둥을 공식적으로 정리했다. 중국은 35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공식적인 평가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문혁’의 경험이 자신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해도 당과 국가의 공식 입장을 대체할 정도로 시진핑의 ‘문혁’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운 구조이다. 또한 그럴 필요성도 지금으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시진핑이 개인 권력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선전 매체와 언론에 대한 대대적인 ‘당’과 ‘당성’을 강조하면서 ‘문혁’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사전에 차단하는 형국이다.
문혁에 대한 시진핑의 최근 평가는 지난 2016년 1월 18일 개최된 중공당 제18기 5중전회 정신을 학습하고 관철하기 위한 성부급(省部級) 주요 영도간부들이 토론회에서 행한 ‘10년 대재앙(十年浩劫)’이라는 표현과 ‘문혁’이 중국을 세계와 단절시켰다는 표현으로 외화 되어 나타났을 뿐이다. 그러나 ‘문혁’과 마오쩌둥에 대한 시진핑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특히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는 마치 시진핑이 마오쩌둥을 추종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전면적이다. 이는 지난 2013년 12월 26일에 있었던 마오쩌둥 탄생 12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행한 시진핑의 연설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당시 연설에서 시진핑은 마오쩌둥을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호방한 기개를 보여준 인생 자체가 혁명적이었던 중국 인민의 운명과 나라의 면모를 철저하게 바꾼 ‘위대한 사람(偉人)’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마오쩌둥을 “바다와 강이 뒤집어져 큰 파도를 일으키고(倒海翻江卷巨瀾)”, “험한 요새가 철옹성 같아도(雄關漫道真如鐵)” 포부를 굽히지 않고 시종일관 끈기 있게 혁명의 길을 걸었던 이상주주의자로 묘사하고 있다. 특히 마오쩌둥을 중국의 특수한 사회 역사 조건 하에서 일련의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고 인민 대중과 혈연적으로 연계된 마르크스주의 정당을 건설했다는 평가에서는 마오쩌둥을 통해서 시진핑이 추구하고자 하는 당의 군중노선의 전거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의 실정에 맞는, 중국 국정에 적합한 사회주의 건설 전략을 수립하는 것은 마오쩌둥이나 시진핑이나 모두 함께 고민하는 문제이며, 특히 시진핑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마오쩌둥이 고민했던 문제와 같은 반열에 있는 문제였다는 점에서 마오쩌둥의 문제 해결 방안에 매우 천착하는 경향성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시진핑의 평가에 따르면 마오쩌둥은 중국이 처한 실제 상황에서 소련의 경험과 교훈, 그리고 새로운 이론과 새로운 저작을 통해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중국 국정과 제2차로 결합하여 사회주의 강국 건설 전략 사상을 만들어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오쩌둥이 새로운 이론을 창조하고 새로운 저작을 통해서 전략 사상을 만들어갔다는 사실이다. 시진핑이 벌이는 사상운동이나 수많은 저작 활동이 맥락적 측면에서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결국 마오쩌둥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의 기초를 마련했기 때문에 자신은 이러한 기초 위에서 사회주의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그 논리적 당위성을 마오쩌둥과 자신을 연결하여 사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오쩌둥이 시도한 것처럼 중국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지도 사상이 필요한 것이고, 그 일단이 바로 ‘4개 전면’, ‘새로운 발전이념’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시진핑은 또한 마오쩌둥의 리더십에 대해서도 매우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시진핑에 의하면 마오쩌둥은 미래를 보는 정치적 식견을 가졌으며, 흔들림 없는 혁명적 신념, 용감한 개척 정신, 숙련된 투쟁 방식 등을 겸비했다. 이를 바꿔 말하면 혁명적인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깊고 심오한 사상이 필요하며, 넓은 도량과 함께 문도무략(文韜武略)을 겸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진핑의 연설에서 사상 무장 강조나 기층과 인민에 대한 애정 그리고 연설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매우 심오한 성어(成語)나 고어(古語) 등이 모두 이러한 리더십 증진을 위한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시진핑은 자신이 집권 기간 마오쩌둥이 가졌던 카리스마적인 권위를 복원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그래서 올해 문혁이 더욱 주목을 받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서 얘기한대로 마오쩌둥의 공과에 대해서 시진핑은 당의 공식 평가에서 한 치도 벗어남이 없다. 1981년 제11기 6중전회에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를 원용하고 있고, ‘공로가 첫째요, 과실은 그 다음’이라는 덩샤오핑의 언술로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고 있다. 그러나 마오쩌둥이 오류를 범했다는 점에서는 부정하지 않으나 그 오류의 원인을 마오쩌둥 개인 한 사람에게만 돌려서는 올바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조심스런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마오쩌둥의 오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주관적 요소, 객관적 책임 그리고 당시 국내외 사회역사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시진핑은 마오쩌둥 평가에 있어서 전면적이고 역사적이며 변증법적인 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준거 틀을 제공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의 이유는 바로 마오쩌둥을 교훈으로 삼기 위한 포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마오쩌둥 사상의 입장과 관점을 기본적으로 세 가지 차원에서 갈무리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실사구시, 군중노선, 독립자주이다. 이 세 가지 가운데 독립자주는 대외 환경에 관련된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그리 논쟁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실사구시와 군중노선의 의미를 주로 짚어보고자 한다. 시진핑의 인식에 따르면 실사구시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관점이고 중국 공산당이 세계를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근본 요구이다. 또한 중국공산당의 기본적인 사상 방법, 공작 방법, 영도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실사구시를 ‘과녁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이라고 비유했다고 보고 마르크스주의 ‘화살’로 중국의 혁명, 건설, 개혁의 ‘과녁’ 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진핑은 실제 생활에서 실사구시를 견지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보고 실사구시의 신념을 굳건히 하고 실사구시의 능력을 높이고 늘 마음에 실사구시를 새겨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앞으로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본 국정을 정확히 인식하는 게 기본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진핑은 중국이 사회주의 실천 과정에서 실사구시를 견지하려면 인민의 이익을 위해 진리를 고수하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사상과 행동이 객관 법칙과 시대의 요구, 인민의 바람에 더 잘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결국 시진핑은 실사구시를 견지하기 위해서는 이론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하고 이론적이고 과학적인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당이 항상 중심에 서야 하며 당이 인민을 영도하여 새로운 경험들을 총괄하고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새로운 경지를 부단히 개척하여 현대 중국의 마르크스주의가 더욱 진리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시진핑은 바로 마오쩌둥의 실사구시를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재사고 하고 있다.
다음으로 마오쩌둥의 생각이 시진핑에 투사되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군중노선의 강조이다. 시진핑에 의하면 군중노선은 중국 공산당의 생명선이고 가장 근본적인 공작 노선이며 당이 활력과 전투력을 영원히 간직하고 있는 가보이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 역시 마오쩌둥과 마찬가지로 ‘대중을 위하여’, ‘대중에 의하여’, ‘대중 속으로’를 중시한다. 중국공산당의 정확한 주장을 군중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전환하고 군중노선을 치국이정(治國理政)의 전체 활동으로 관철시켜 나가기 위해서 마오쩌둥이 그랬던 것처럼 늘 대중을 중심에 두고 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인민대중이 곧 역사의 창조자’라는 마르크스 기본 원리를 군중노선이 체현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시진핑은 ‘인민 군중이 곧 역사 발전과 사회 진보의 주체’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고 있다. 시진핑은 마오쩌둥이 “중국의 운명은 인민의 손에 달려 있다. 중국은 태양이 동쪽에서 솟아오르듯 자체의 빛으로 대지를 널리 비출 것이다.”라는 말에서 그 맥락의 근원을 찾고 있는 셈이다.
결론적으로, 시진핑에게 있어서 ‘문혁’은 10년 동란이고 대재앙이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자신이 기층에서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과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그 과정과 결과가 매우 참혹하고 비참해서 그래서 잊혔으면 하고 바라는 중국 현대사의 상처일지 모른다. 그러나 시진핑 개인에게는 기층과 인민을 체득하게 해준 기회이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성장의 계기가 되었다고 해도 그 시절이 고통스럽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진핑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 ‘문혁’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역사의 평가에 맡긴다는 것은 비교적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동시에 개인의 경험이 당과 국가의 결정과 결의보다 더 중요하게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는 보수적인 접근의 결과일 수도 있다. 아직은 ‘문혁’에 대한 평가가 1981년에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시진핑의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는 매우 적극적이다. 시진핑은 근현대 중국의 역사과정을 중국공산당이 영도한 ‘혁명’, ‘건설’, ‘개혁’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 세 과정 가운데 ‘혁명’과 ‘건설’의 두 과정은 마오쩌둥과 관련되어 있다. 시진핑은 그가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 성과 또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가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중되어야 하고 추앙받아야 한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그럼 나머지 한 과정인 ‘개혁’의 과정은 누가 주도하는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덩샤오핑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시진핑은 덩샤오핑은 ‘개혁’의 발판을 마련했을 뿐이라는 시각이다. ‘개혁’의 완성은 자신의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보여준 마오쩌둥의 리더십을 교훈으로 삼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시진핑이 죽은 마오쩌둥을 불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문혁’ 50주년 마오쩌둥이 조심스럽게 살아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