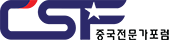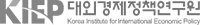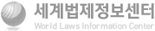전문가오피니언
Home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의 소프트파워 변화 추세와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
김지용 소속/직책 : 해군사관학교 교수 2025-03-10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파워 통념과 차이나 디스카운트, 2007~2019
소프트파워라는 개념과 그 개념의 현실적 적용은 나이(Joseph Nye)가 저술한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1990),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2004), Do Morals Matter? Presidents and Foreign Policy from FDR to Trump (2020), Soft Power and Great Power Competition (2023) 등을 통해 대중화되고 진화해왔다. 또한, 그는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대해서도 많은 논평을 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Wall Street Journal의 2005년 12월 29일자 칼럼 “The Rise of China’s Soft Power”와 2012년 5월 8일자 칼럼 “China’s Soft Power Deficit” 그리고 Project Syndicate의 2015년 7월 10일자 칼럼 “The Limits of Chinese Soft Power”와 2018년 1월 4일자 칼럼 “China’s Soft and Sharp Power” 등이다.
그에 따르면, 소프트파워는 무력을 동원한 강압이나 경제적인 보상 없이도 타국의 자발적 순응과 정치적 지지를 얻어낼 수 있는 매력적인 리더십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존 패권국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오랜 기간 결속시키고 유지하며 확장하는 데 있어 소프트파워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부상하는 잠재적 패권국이 자국의 하드파워(군사력, 경제력)에 대한 타국의 우려를 불식시켜 견제세력(balancing coalition)의 등장을 예방하는 데에도 소프트파워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때문에, 소프트파워는 그 명칭과 다르게 기존 패권국인 미국과 잠재적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간의 전략경쟁에서 매우 중차대한 우선순위에 있다. 소프트파워의 원천은 ① 문화 ② 사회적 가치 ③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다.
①과 ②의 인류보편성이 크고 ③이 지구적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나 진입장벽이 낮은 저렴한 클럽재(club goods)를 제공하는 방식일수록 소프트파워도 커진다. ③은 현재의 행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기간에 변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①과 ②는 유전적 DNA처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이어서 단기간에 변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나이는 유전적 소프트파워 중에서도 ②가 더 중요하다고 보면서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저평가한다. 그는 중국의 진시황 병마용(兵馬俑) 전시회와 미국의 퓰리쳐(Pulitzer) 사진전을 비교한다. 1976년에 시작되어 2024년 9월까지 49개국, 200개 도시에서 277회의 해외전시를 통해 2천만 명이 넘는 방문객을 불러모은 병마용 전시전은 중국 고대 왕조의 문화적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병마용 전시전이 중국에 대한 정치적 호감도나 중국공산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특히, 분서갱유(焚書坑儒)라는 반인륜적 악행을 저질렀던 진시황의 병마용을 보면서 현 중국을 연상하는 것은 중국의 소프트파워에 오히려 해가 된다. 다른 한편, 인종차별, 스캔들, 전쟁범죄 등 미국의 불편한 진실을 가감 없이 고발하는 퓰리쳐 사진전은 미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의심하게 될 정도로 충격적이다. 그럼에도 방문객의 미국에 대한 정치적 호감도는 매우 높다. ‘정치적·사회적 부조리를 개선하려면 공공보도의 자유로운 비판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미국의 사회적 가치가 인류보편적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①과 ②의 인류보편성이 크게끔 보이도록 하는 활동을 공공외교 또는 대외선전이라고 한다.
중요한 것은 그러한 활동을 관(官)이 아닌 시민사회, 대학, 재단, 비영리단체 등 민(民)이 주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관의 주도로 막대한 정부 재원이 투자되기 시작하면 소프트파워의 ‘소프트’한 측면이 사라지고, 인위적으로 조작된 매력은 외면받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중국 전문가인 샴보(David Shambaugh)는 China and the World (2020)에서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저평가되는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다. 첫째, 2007년 제17차 당대회에서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소프트파워(軟實力) 강화를 공식 천명한 이후 중국은 연간 100~200억 달러를 소프트파워 강화 사업에 쏟아부어 왔다. 둘째, 시민사회가 스스로 대변하게끔 정부가 수동적으로 관망해야 할 때조차도 중국공산당은 통일전선 작전을 구사하듯 적극적으로 관여해 왔다.
실제로 Pew Research Center가 21개국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행한 Global Attitude Survey1)는 나이와 샴보의 주장을 지지한다. 2007년, 미국보다 중국에 더 우호적인 국가는 16개국이었다. 그런데 2010년엔 그 수가 9개국으로 줄어들고 말았다. 3년간 쏟아부은 300~600억 달러를 허공에 날려버린 셈이다. 이 때문에 나이는 “가장 좋은 대외선전은 대외선전하지 않는 것”(the best propaganda is not propaganda)이라는 충고를 하기도 했다. 이러한 차이나 디스카운트가 나이와 샴보의 주장 그리고 Global Attitude Survey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영국 런던의 컨설팅회사 Portland가 2015년부터 5년간 발표한 Soft Power 30이라는 지수와 세계순위 역시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재입증했다.
이 지수는 여섯 가지 객관적 지표2)와 25개국 세계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구성된 주관적 지표3)를 종합하여 산출된다. <표 1>에서 영국과 한국은 지수의 타당성(validity)을 살펴보기 위해 포함한 비교군이다. 이 지수에 따르면, 중국의 세계순위는 2015년에 30위, 2016년에 28위, 2017년에 25위로 상승세를 타다가 2018년과 2019년에는 다시 두 계단 하락한 27위에 그쳤다. 같은 기간 미국은 3위, 1위, 3위, 4위, 5위로 중국과의 격차는 상당히 컸다. 그러나 2020년대로 진입하면서 역전(overtaking)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2020년대 초는 서방에서 공자학원 퇴출 바람이 거세지고, 판다외교가 금전 이익 추구 및 생명 거래로 비판받는 시점이었는데도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표 1> Portland의 Soft Power 30 Index4)

미중 간 소프트파워 전이(Soft Power Transition), 2020~2024
세계적인 기업·국가 브랜드 평가 회사인 Brand Finance는 2020년부터 5년간 Global Soft Power Index라는 지수와 세계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상술한 Pew Research Center나 Portland와는 사뭇 다른 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이 지수는 앞의 두 조사보다 훨씬 광범위한 여론조사에 기반하고 있고, 매년 Global Soft Power Summit을 영국 런던에서 개최하여 지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측정방법을 개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이 매우 크다. 이 지수는 100개국 170,0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설문 조사는 8가지 구체적인 영역5)과 3가지 추상적인 영역6)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에서 미국은 2020년 1위에서 2021년 6위로 하락했지만 2022년에 1위를 재탈환하여 3년간 유지했다.
<표 2> Brand Finance의 Global Soft Power Index7)
앞서 살펴본 Portland의 5년간(2015~2019) 미국 세계순위 평균이 3.2위이고 Brand Finance의 5년간(2020~2024) 세계순위 평균이 2위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없다. 영국도 전자는 1.6위고, 후자는 2.4위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한국의 경우엔 전자는 20.4위고, 후자는 13.4위로 7순위 높게 평가되었다. 중국의 경우엔 더욱 극적인데 전자는 27.4위고, 후자는 5위로 무려 22순위나 높게 평가되었다. 이 때문에 Brand Finance가 Portland보다 서방에 불리하게 소프트파워를 측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소프트파워라는 개념을 상이한 방법으로 측정했음에도 영국, 미국 등 최상위 국가의 순위에 변화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미국은 오히려 상승) 그러한 비판은 방어될 수 있다.8)
이것은 Brand Finance 역시 서방에 유리한 기준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의 소프트파워가 ‘서방식으로’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보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2024년 10월 20일에 공개한 “Measuring Soft Power: A New Global Index”라는 보고서의 내용이다. 이 보고서가 채택한 소프트파워 지수의 명칭 역시 Brand Finance와 같은 Global Soft Power Index다. 여섯 가지의 하위 지표9)로 구성된 이 지수의 시간적 범위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고 공간적 범위는 66개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림 1>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 도드라지는 점은 2021년 세계순위에서 한국, 일본, 중국이 각각 1위,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전통적인 소프트파워 강국들이 10위 밖으로 밀려나지는 않았다.
<그림 1> IMF의 Global Soft Power Index 2021 세계순위10)
<그림 2> IMF의 Global Soft Power Index 추세 비교: 중국 vs. 영국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영국은 여전히 10위 내에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IMF가 서방에 유리한 기준을 채택했음에도 동북아 3국의 소프트파워가 ‘서방보다 더 서방식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물론, 여전히 논쟁적인 부분이 있다. <그림 2>와 <표 1>의 모순이 그것이다. <그림 2>는 영국과 중국의 소프트파워 추세를 IMF 지수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2015년 전후로 영국을 추월했고 그 격차는 2019년에 가장 크게 벌어졌다. 이와 대조적으로 <표 1>의 Portland 지수에 따르면, 2015년 영국과 중국은 각각 1위와 30위로 격차가 매우 컸다. 2019년에도 영국과 중국은 각각 2위와 27위로 순위 격차는 대동소이했다. 본 고에서 어느 지수가 더욱 정확한 것인지를 방법론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논외로 한다.
다만 조사 대상이 된 샘플의 크기와 조사의 시간적 범위를 언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 이것만으로도 지수의 신뢰성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호감도 또는 소프트파워에 대한 측정은 네 곳의 기관에서 별도의 지수를 개발하여 수행했다. Pew Research Center(Global Attitude Survey)와 Portland(Soft Power 30)는 중국에 대한 호감도 또는 소프트파워를 낮게 평가했고, Brand Finance(Global Soft Power Index)와 IMF(Global Soft Power Index)는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샘플의 크기와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Pew Research Center(21개국, 2007~2010), Portland(25개국, 2015~2019), Brand Finance(100개국, 2020~2024), IMF(66개국, 2007~2021).
트럼프 2.0과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 2025~
소프트파워에서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논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2025년 1월 20일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트럼프 2.0 행정부, 여당인 공화당은 미국의 하드파워 복원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때문에, 미중 간 소프트파워 전이에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1.0 행정부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파리기후협정, 이란핵협정, 북미자유무역협정,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탈퇴했으나 바이든(Joseph Biden) 행정부가 이러한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파리기후협정 탈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시작으로 세계보건기구,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 등에서 탈퇴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미국 소프트파워의 한 축을 담당해온 국제개발처(USAID)를 사실상 폐지했다. 2025년 2월 14~16일 독일에서 개최된 뮌헨안보회의에서 벤스(James Vance) 부통령은 첫 일성으로 “마을에 새 보안관이 왔다”(There‘s a new sheriff in town)라고 언급하며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임을 공식화했다. 실제로 4일 후인 2월 20~21일 남아공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재무장관과 국무장관도 불참했다. 심지어 2월 23일엔 미국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 유엔 관료들에 대한 외교 면책권 폐지 등 유엔 참여를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러한 행동들은 미국의 소프트파워와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서두에서 언급한 소프트파워의 세 가지 원천 가운데 세 번째는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유전적 소프트파워인 문화 및 사회적 가치와 달리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단기간에 소프트파워의 증감을 결정한다. 현재 American First를 넘어 America Only를 표방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행보를 고려할 때, 미국의 소프트파워는 매우 빠르게 중국에 잠식될 가능성이 크다. 이유는 값비싼 클럽재를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려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진입장벽이 낮은 저렴한 클럽재를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의미하는 클럽재란 기존 패권국 또는 부상하는 잠재적 패권국이 국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국의 정치경제적 비용을 들여 건설한 국제레짐을 의미한다. 이를 이론적으로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국내정치에서는 정부가 등대나 국방처럼 ‘소비의 비경합성과 혜택의 비배제성’의 특징을 갖는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구성원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한다. 이른바 강제승차를 통한 공공재 생산이다. 그렇다면, 압도적인 권위체가 부재한 국제적 무정부상태에서 해양수송로의 원활한 관리,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성, 국제경제의 개방성,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 반테러작전 같은 지구적 공공재는 어떻게 생산되는가? 다양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유력한 설명은 패권국의 존재다. 패권국은 절대다수의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구적 공공재를 생산하기 위해, 타국의 무임승차를 허용하면서 과도한 부담을 짊어진다. 대신 지구적 공공재 수혜를 받는 국가들로부터 리더십을 인정받고 견제세력의 결성을 예방할 수 있다.11)
또한, 패권국은 자국의 이익, 이념 및 가치가 녹아든12) 지구적 공공재를 통해 향후 국력이 쇠퇴해도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구적 공공재 수혜를 받는 국가의 수가 많아질수록 지구적 공공재는 제도화, 법제화, 기구화되는 경향이 있고 그로 인해 경로의존성을 띠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구적 공공재를 제공하던 패권국의 국력이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쇠퇴할 경우, 패권국은 무임승차 방지, 응집력 제고, 미래행보 통제, 자국의 자원절약을 위해 지구적 공공재를 <표 3>에서와 같이 ‘소비의 비경합성과 혜택의 배제성’ 특징을 갖는 클럽재로 변환한다. 특히 멤버십이 엄격하고 가입 요금이 비싼 클럽재로 변환한다. 그러한 클럽재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바로 小다자주의(minilateralism) 국제레짐 중심 글로벌 거버넌스다.
<표 3> 세력전이와 클럽재 경쟁의 양상13)
가령, 쇠퇴하는 패권국인 미국은 안보 분야에서 Aukus(미국, 영국, 호주), Quad(미국, 인도, 일본, 호주), Five Eyes(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I2U2(인도, 이스라엘, 미국, 아랍에미리트), 한미일 연대 그리고 경제 분야에서 Chip 4(미국, 한국, 일본, 대만),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한국, 호주, 핀란드, 스웨덴, 유럽연합), Partners in the Blue Pacific(미국, 영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의 소다자주의 국제레짐을 출범시켰다. 이들 국제레짐에 가입하기 위해선 ‘보편적 가치 및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강력한 커밋먼트(commitment)라는 엄격한 멤버십이 요구된다. 또한, ‘규칙 기반 자유주의 질서’의 복원에 소요되는 값비싼 비용14)을 지불해야 한다.
당연히 이러한 멤버십 자격을 갖추고 값비싼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는 국가는 소수일 수밖에 없다. 이때 부상하는 잠재적 패권국은 <표 3>과 같이 진입장벽이 낮은 저렴한 클럽재를 창출한다. 이를 통해 부상하는 잠재적 패권국은 자국의 지지기반을 넓혀 평화적인 현상타파를 시도한다. 다만, 유인책이 저렴한 클럽가입 요금이므로 부상하는 잠재적 패권국은 많은 정치경제적 부담을 기꺼이 지고자 한다. 실제로 중국은 지구촌 남반구(global south)를 포섭하기 위해 느슨한 멤버십 자격과 가입 비용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저렴한 클럽재를 창출해왔다. 중국의 정체성인 탈식민국가, 개발도상국가, 권위주의국가 같은 정체성을 공유하고 ‘다극화된 질서 및 국제관계의 민주화’라는 정치적 구호에 동의하는 정도의 자격이면 충분했다.
이런 식으로 건설된 국제레짐은 상하이협력기구(SCO, 1996년 창설),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2000년 창설), 중국·아랍국가협력포럼(CACF, 2004년 창설), 브릭스(BRICS, 2009년 창설), 중국·중남미포럼(China·CELAC, 2011년 창설), 중국·중/동부유럽국가정상회의(CEEC, 2012년 창설) 등이다. 일대일로(BRI)와 같은 경제적 유인책과 발언권(voice opportunity) 보장은 지구촌 남반구의 대다수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이 중국 주도의 국제레짐에 가입하는 것을 촉진했고 그들 간의 결속력을 강화했다. 그러한 결속력은 이제 유엔 일반총회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것은 1965년 9월 중국 국방장관 린뱌오(林彪)가 제창한 “농촌(개도국)으로 도시(북미와 서유럽)를 포위한다”는 인민전쟁론의 21세기 국제적 확장판인 셈이다.
미국의 유엔 참여를 중단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중국은 이제 소프트파워 초강대국이 되기 위해 저렴한 클럽재로 국제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거버넌스를 추구하고 있다. 훗날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게 된다면 중국은 저렴한 클럽재를 지구적 공공재로 변환하여 소프트파워를 극대화하고 리더십을 거머쥐게 될 것이다. 중국의 소프트파워를 저평가한바 있는 나이는 Project Syndicate의 2017년 1월 9일자 칼럼 “The Kindleberger Trap”에서 새롭게 부상한 국가가 기존 패권국을 대신해 지구적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위기를 킨들버거의 함정으로 명명하면서 중국 때문에 킨들버거의 함정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 중국의 소프트파워와 킨들버거의 함정에 관한 그의 주장은 보류되어야 할 것 같다.
---
1) https://www.pewresearch.org/global/2010/06/17/chapter-5-views-of-china/
2) 첫째는 문화 요인으로 해당 국가의 문화가 얼마나 인류보편적인지를 13가지 지표로 측정한다. 둘째는 교육 요인으로 해당 국가에 우호적인 세력이 될 수 있는 외국인 학생을 얼마나 많이 유치하고 있는지를 5가지 지표로 측정한다. 셋째는 참여 요인으로 해당 국가가 국제 공동체에 얼마나 많이 공헌하고 있는지를 12가지 지표로 측정한다. 넷째는 기업 요인으로 해당 국가가 얼마나 혁신적이고 사업 환경이 건전한지를 12가지 지표로 측정한다. 다섯째는 디지털 요인으로 해당 국가의 지도자, 정부, 외교부가 세계와 얼마나 잘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고 있는지를 10가지 지표로 측정한다. 여섯째는 정부 요인으로 해당 국가의 인간안보가 얼마나 잘 보장되고 있으며 거버넌스 모델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16가지 지표로 측정한다.
3) 주관적 지표는 25개국 12,500명(국가별 500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측정한다. 대륙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북미(미국, 캐나다), 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오세아니아(호주), 동아시아(중국, 일본, 한국),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남아시아(인도), 중동/북아프리카(이집트, 사우디, 튀르키예, 남아공), 유럽(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4) https://softpower30.com
5) 첫째는 사업/무역 영역으로 세계적인 기업 브랜드, 성장동력 등 4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둘째는 거버넌스 영역으로 지도자의 평판, 인권존중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셋째는 국제관계 영역으로 국제적인 공헌도 관련 3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넷째는 문화/유산 영역으로 예술과 대중문화 관련 6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다섯째는 미디어/소통 영역으로 소통 플랫폼의 명성, 신뢰성, 용이성 등 4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여섯째는 교육/과학 영역으로 주도적인 과학자, 교육시스템, 우주탐사 투자 등 4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일곱째는 사람과 가치 영역으로 국민성 관련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여덟째는 지속가능 미래 영역으로 환경보호, 녹색산업 등 4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6) 추상적인 영역은 친숙함, 평판, 영향력에 대한 직관적인 문항으로 구성된다.
7) https://brandirectory.com/softpower
8) 물론 Portland의 지수와 Brand Finance의 지수 간 상관관계(correlation)를 분석하여 상관계수(ρ)를 확인해봐야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9) 첫째는 상업적 매력으로 해외투자액, 특허 출원 건수, 대표적인 무역 상품의 수 등 3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둘째는 문화적인 존재감으로 문화 수출상품의 수, 관광객의 수, 올림픽 메달의 수, 세계 유산의 수 등 4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셋째는 디지털 역량으로 인터넷 접근성, 모바일폰 접근성 등 2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넷째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적 영향력으로 교육예산, 문해력,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투자액, 탑저널 수 등 8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다섯째는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대사관의 수, 이민 수용력, 난민 수용력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여섯째는 국내제도의 내구성으로 관료적 효율성, 청렴도, 민주적 책임성, 정치적 안정성, 법의 지배 등 5가지 지표로 구성된다.
10) https://www.elibrary.imf.org/view/journals/001/2024/212/001.2024.issue-212-en.xml?cid=555898
11) 김지용. 2019. “세력전이와 해양패권 쟁탈전.” [글로벌정치연구] 12권 2호.
12) 가령, 해양수송로의 원활한 관리는 미국 상선과 군함의 자유항행을, 국제통화체제의 안정적 관리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위상을, 국제경제의 개방성은 미국의 경기활성과 경제적 관여의 지속성을,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은 미국의 군사적 패권유지를, 그리고 반테러작전은 반미주의의 제압을 반영하고 있다.
13) 김지용. 2017. “세력전이와 외교전략.” [국제관계연구] 22권 1호.
14) 미중 사이에서 헤징을 포기하는 것, 중국과의 무역을 축소하는 것, 미국 주도의 대만 해협 통과 작전 및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작전에 동참하는 것 등이 값비싼 비용에 해당한다.
| 이전글 | AI發 미중대립의 후폭풍과 우리경제 | 2025-03-12 |
|---|---|---|
| 다음글 | 소비 트렌드를 넘어 문화로 진화하는 궈차오 열기 | 2025-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