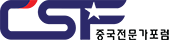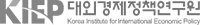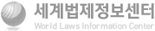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中 배터리 기업들,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선도 위해 기술력 강화
안희정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3-28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은 2025년 '양산 원년'을 앞두고 급성장 중이며, 중국 기업들은 '완제품 통합, 핵심 부품 자체 연구개발' 전략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입지를 다지고 있음. 특히 EVE에너지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확보함. 이들은 고에너지 밀도, 안전성, 경량화된 배터리 기술을 개발하여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산업 지원 정책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음.
◦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폭발적 성장 및 시장 전망
-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은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중신증권(中信证券)에 따르면 202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출하량은 1만대를 돌파할 전망이며, 2030년에는 약 500만대에 이르러 시장 수요가 약 7,500억 위안(약 150조 9,67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골드만삭스(Goldman Sachs)는 2035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1,540억 달러(약 225조 4,86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특히 2025년을 '양산 원년'으로 보고 있으며, 당해 글로벌 시장이 150억 달러(약 21조 9,630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정보통신연구원(中国信通院)의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발전 연구보고서(2024년)'에 따르면, 글로벌 측면에서 미국의 테슬라(Tesla), 피규어AI(FigureAI), 보스턴 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가 해외 휴머노이드 로봇 완제품 분야 1차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1X, 디짓(Digit) 등 유럽 및 미국 제품이 2차 선두 그룹을 형성함. 이들 제품은 전반적으로 지능화 수준과 종합 성능이 높으며 테슬라 제품은 이미 시나리오 테스트 단계에 진입함.
- 중국 기업들은 '완제품 통합, 핵심 부품 자체 연구개발'이라는 노선을 채택하여 완제품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고 있음. 현재 수십 종의 휴머노이드 로봇 제품이 출시되었으며, 안정적인 걷기, 달리기, 점프, 일어서기 등 기본 기능을 갖추고 있음. 기술적으로도 일정 수준의 축적이 이루어져 해외 기업과 뚜렷한 세대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 최근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가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 100: 휴머노이드 로봇 가치 사슬 지도 그리기' 보고서에는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사슬에서 상위 100개 상장기업이 정리됨. 여기에는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 참여하는 기업 82개와 참여 잠재력이 있는 기업 18개가 포함되었으며 중국 기업은 35개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함.
- 2023년 11월, 중국 공업정보화부(工信部)는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발전 지도 의견'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하고 '대뇌, 소뇌, 사지' 등 핵심 기술의 혁신적 발전을 이룰 것을 목표로 제시함. 또한 핵심 부품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급을 보장하고, 완제품이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하여 배치 생산을 실현하며, 특수, 제조, 민생 서비스 등 시나리오에서 시범 응용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함.
◦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기술 개발 동향과 핵심 수요
- 휴머노이드 로봇은 지속적인 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고성능 전원이 필요함.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가 주류이나 에너지 밀도, 순환 수명 등 측면에서 여전히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의 장시간, 고부하 작업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피규어AI가 출시한 피규어 02 휴머노이드 로봇은 2.25kWh(킬로와트시)의 배터리 팩을 장착하고 있으며, 한 번 충전으로 5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음. 반면 중국의 대부분 휴머노이드 로봇의 작동 시간은 일반적으로 2~4시간에 불과함.
-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의 핵심 요구사항은 고에너지 밀도, 고안전성, 빠른 충방전, 긴 순환 수명, 경량화, 소형화 등에 집중되어 있음. 현재 주류 솔루션은 고니켈 삼원 리튬 배터리(에너지 밀도 250-300Wh/kg)와 반고체 배터리(300-400Wh/kg)이며, 전고체 배터리(500Wh/kg+)는 연구개발 단계에 있음.
- 현재의 휴머노이드 로봇 대부분은 한 개의 배터리만 장착되어 있음. 그러나 휴머노이드 로봇의 각 부품은 전압, 전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다르며, 향후 배터리가 분산형으로 설계된다면 로봇의 지속 운행 유연성과 신체 힘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 아트로봇(Art Robot)의 공동 창업자 왕전차오(王振超)는 "인간의 에너지가 신체 각 부위에 분포되어 있는 것처럼 분산형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에너지가 각 신체 부위에 분포되도록 한다"고 설명함.
-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이 높고 에너지 밀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배터리를 분리식으로 관리하기에도 더 용이함. 왕전차오는 "에너지 소비 문제는 여전히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며 "현재는 충전 한 번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2~3시간 정도밖에 걸을 수 없지만, 일상생활이나 산업 생산에서는 로봇이 최소 8~12시간 연속 작동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점차 산업화 단계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지르코늄 기반 소재 발전에 좋은 시장 기회를 제공함. 업계 전문가는 "고순도 산화지르코늄은 산화물 기술 노선의 핵심 소재"라며 "전고체 배터리가 지르코늄 산업에 새로운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함.
◦ 중국 배터리 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선점 전략
- EVE에너지는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분야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모건스탠리 보고서에 따르면, 배터리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동력 심장'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실제 공급 역량을 갖춘 기업은 많지 않음. 모건스탠리는 EVE에너지, CATL,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등 4개 기업만을 해당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선정함.
- EVE에너지는 3월 초 "이미 주요 휴머노이드 로봇 고객 및 자동차 계열 고객과 접촉했으며 일부 고객은 샘플 납품 및 조립을 완료했다"고 밝힘.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는 주로 원통형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성된 팩을 로봇 몸통에 설치하여 지속 운행을 제공함. 또한 로봇은 다양한 센서용 백업 배터리도 필요로 함.
- EVE에너지는 리튬 티오닐 클로라이드 배터리 등 성숙한 제품으로 인코더 백업 전원 등 세분화된 수요를 해결하고, 전체 형태의 리튬 배터리 계통으로 다양한 에너지 밀도와 응용 시나리오를 포괄하는 솔루션을 구축함. 또한 전고체 배터리 등 전략적 배치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용 에너지 네트워크를 준비 중임.
- 지난해 6월, EVE에너지는 녹색 교통, 에너지 전환, 미래 탐색 등을 포괄하는 전방위 리튬 배터리 솔루션을 발표함. 이 기업은 리튬 일차 배터리, 소프트 팩 삼원, 각형·원통형 삼원, 각형·원통형 인산철 리튬 등 전체 형태의 리튬 배터리 계통을 형성했으며, 원통형 배터리 출하량은 글로벌 4위, 중국 국내 1위를 차지함.
- 전고체 배터리 측면에서 EVE에너지는 2026년에 고출력, 고환경 내성의 전고체 배터리를, 2028년에는 400Wh/kg 고비능 전고체 배터리를 출시할 계획임. 회사는 '지상-저고도-휴머노이드' 3차원 경로를 따라 배터리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eVTOL 배터리 영역에도 진출해 항공 분야 인증을 획득함.
- EVE에너지는 배터리 생산을 넘어 로봇 사업으로도 확장을 시도함. 최근 자회사의 사명을 '후이저우 진위안 스마트 로봇(惠州金源智能机器人)'으로 변경하고 스마트 로봇 연구개발 등을 경영 범위에 추가함. 이는 중국 로봇 산업이 글로벌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EVE에너지가 '중국 스마트 제조'의 고부가가치 사슬 구축에 기여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음.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 이전글 | 이전글이 없습니다. | |
|---|---|---|
| 다음글 | AI와 라이선스아웃으로 가속화되는 中 제약사의 글로벌 도약 | 2025-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