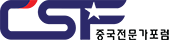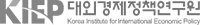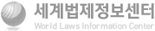전문가오피니언
Home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안토니오 그람시의 이론으로 본 중국 정치와 외교
함명식 소속/직책 : 길림대학 공공외교학원 부교수 2025-04-17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 주석의 취임 이후 중국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의 모든 분야가 급격한 변화를 겪어왔다. 표면적인 변화 중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개혁개방의 설계자이자 점진적인 정치 개혁의 밑그림을 제시한 덩샤오핑 전 총서기의 유훈 정치에 조종이 울렸다는 것이다. 물론 현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설명과 해석은 이와 상반된다. 이들에 따르면 현재의 국제정세는 역사적인 대변혁기에 접어들었고 이 과정에서 과거와 달라진 중국의 위상 변화에 요구되는 시대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과거 정치지도자의 유산을 손상하지 않으면서도 역사적으로 중국 공산당에 부과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 전략, 구상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치체제와 제도의 개선이 불가피하다.
시진핑 체제의 출범 이후 중국 국내정치와 대외 정책의 변화를 보는 중국학계와 외부의 시각은 판이하게 나뉘어 있다. 중국학계의 대다수 연구는 국내 정치체제 변동을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실천을 위한 합리적 과정으로 묘사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거버넌스 변화의 필요성을 주창하거나 지지하는 내용 일색이다. 이에 반해 서구 학계의 주된 관점은 중국 정치의 변화가 시진핑이라는 지도자의 권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이전까지 부분적으로나마 진행돼온 정치 개혁의 후퇴를 의미하며,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정책도 미국 패권을 대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기에 기존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현상(역사적 사실)을 놓고 중국과 서구 학계가 이처럼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상호 모순된 주장을 되풀이하는 두 진영의 입장이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는 단서를 지금은 고인이 된 캐나다 국제정치학자 로버트 콕스(Robert Cox)의 학문적 성찰에서 찾을 수 있다. 살아생전에 미국 주도의 국제정치이론, 특히 현실주의에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콕스는 “이론은 항상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Theory is always for someone and for some purpose)1)는 격언을 남겼다. 이는 과학, 객관, 실증이라는 이름으로 무장한 사회과학 이론이 사실은 특정한 정치행위자의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주관적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결국, 인간의 집단적 정치 행위의 원인과 이로 인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내지는 ‘상관관계’의 입증을 목표로 하는 사회과학도 학문적, 정치적, 실천적 차원에서 특정한 집단의 이익 실현과 완전히 결별하기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다.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이론: 중국을 보는 새로운 창
콕스는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에게서 학문적 영감을 얻었다. 특히 그람시의 헤게모니(Hegemony) 이론을 응용해 국제정치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람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식을 규정짓는 물적 토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고전적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했다. 하지만 전간기 산업이 발달한 유럽 국가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실패한 원인 탐구에 몰두한 그람시는 생산력과 생산 관계에서 기인하는 모순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배계급의 아이디어(hegemonic ideas)가 수행하는 역할에 주목했고 그의 사고를 감옥에서 집필한 『옥중수고』(Prison Notebooks)에 남겼다. 그람시에 따르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노동자계급은 자본가계급이 생산한 지배적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 사이에 존재하는 계급적 정체성을 약화하고 결국 사회주의 혁명의 전위부대로서의 노동자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데 일조한다.
그람시는 혁명의 기운이 고조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는 정치적 격변기의 전략을 기동전(war of maneuver)으로, 발달한 자본주의로 인해 혁명이 지연되는 시기에 전개할 전략을 진지전(war of position)으로 정의했다. 짧은 기간에 수행할 기동전의 범위와 횟수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람시에게는 미래의 기동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펼쳐지는 장기간의 진지전에서 승리하는 일이 보다 임박한 과제였을 것이다. 이는 자연스레 기동전에 앞서 진지전을 효율적으로 진두지휘할 수 있는 현대의 군주(modern prince)로서 전위정당의 건설과 유지에 그람시가 큰 관심을 기울였음을 짐작하게 한다.2) 즉, 현대의 군주로서의 전위조직체는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의 문화와 각종 제도, 언론, 종교, 교육에서 양산하는 지배적인 아이디어에 맞서 대항 아이디어(countering ideas)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계급의 의식을 보호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그람시가 서구 자본주의 시스템에 저항하는 마르크스주의자였고, 그람시의 이론이 현대 정치와 사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이론(critical theory)으로 널리 활용된다는 점에서 그람시의 시각으로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의 국내정치와 외교정책을 분석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학술적인 의미가 있다. 첫째,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마르크스주의를 계승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의 주요 이론가인 그람시의 분석 틀로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분석하는 작업과 관련한 이론적 정합성이다. 중화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립 이후 중국의 정계와 학계는 중국이 마르크스주의를 이념적 토대로 삼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임을 끊임없이 강조해왔다. 이를 입증하듯 중국학계의 공산주의 연구는 변증법적 유물론, 역사적 유물론, 공산당의 역할, 제국주의론, 종속이론, 계급정치 분석 등 다양한 범주의 마르크스주의를 연구해 왔다.
하지만 중국학계의 더 큰 관심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과 같이 마르크스주의를 중국 상황에 적합하게 재해석한 정치지도자들의 이념과 지침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영도적 역할과 중국 사회주의 체제를 정당화하는 것에 있다. 그 결과 그람시 이론은 자본주의와 패권주의에 맞서는 대항 아이디어로써의 역할 내지는 비판적인 정치이론이나 문화 담론의 일부로 연구돼왔다. 중국학계와 중국 외부 좌파 학계의 그람시 연구가 전반적인 흐름에서 일치하는 것은 사실이나 중국 내부에서 그람시 이론 자체를 통해 중국의 국내정치와 외교 전략을 분석한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측면에서 그람시 이론의 적용은 현 사회주의 중국 정치체제의 대내외적 정치 동학을 이해하는 새로운 창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그람시 이론을 통해 중국을 분석하는 것은 서구의 비교정치와 국제정치 이론을 서구만의 역사적 경험, 제도, 가치에 기반한 이론이라고 비판하는 중국학계의 비판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학계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 현상을 ‘중국 특색’이라는 렌즈로 접근하는 것이다. 중국 특색의 강조는 자신만의 고유한 역사적 경험, 문화적 특성, 정치사회체제를 유지해온 비서구 국가인 중국을 유럽의 경험에 기반한 이론으로 일반화, 보편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표현이다. 그 결과 중국학계에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 중국 특색의 국제정치이론, 중국 특색의 소프트파워, 중국 특색의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담론이 범람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과 역사적 경로를 강조했던 중국이 자신의 경험을 중국과 확연히 다른 역사, 언어, 문화, 종교, 인종으로 구성된 비서구 세계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모델로 제시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함께 국제자본주의 체제의 핵심축으로 기능하는 중국이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국의 정치체제, 경제모델, 이데올로기를 적극적으로 수출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제도와 문화에서 파생된 이데올로기의 힘에 주목한 그람시의 이론은 패권 도전자인 중국이 대내외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대항 이데올로기를 생산, 확산, 고착화하는 과정을 탐색하는 훌륭한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또한, 중국 자체의 내재적 속성을 정치 안정 유지와 패권 경쟁의 방편으로 활용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은 중국 연구에서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 논쟁의 간극을 일정 정도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안토니오 그람시 이론의 중국 적용
대항 이데올로기(Countering Ideology): 여타의 마르크스주의자들과 그람시의 차이점은 지배계급의 패권이 강제적인 물리력의 사용(coercion) 외에도 피지배계급의 자발적인 동의(consent)에 기반하고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그람시는 기본적으로 피지배계급이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극복해야 기존 질서를 해체하는 혁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에 주목한 그람시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대항 이데올로기의 창출과 확산을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핵심 요인으로 간주했다. 시진핑 시대의 중국이 국제질서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벌이는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부의 단결을 유지하고 글로벌 청중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대항 이데올로기를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시진핑 주석은 집권과 동시에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기치로 내걸었다. 중국몽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년이 되는 2021년까지 샤오캉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을 최강대국으로 만들겠다는 장기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아편전쟁 이후 중국이 경험한 역사적 굴욕을 극복하고 중화민족이 세계를 주도하리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몽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내부의 결집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면 대외적인 명분과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시진핑 정부가 내세운 대항 이데올로기로 인류운명공동체를 들 수 있다. 인류운명공동체가 명목상으로는 모든 인류를 포괄하고 있지만 이를 환영할만한 실질적인 청중은 개발도상국 국가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최근 중국이 글로벌 사우스(Global South)를 주창하며 세계를 이원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데서 확인할 수 있다.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중국이 내세우는 중국몽,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인류운명공동체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서구가 역사적으로 자행한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비도덕성을 되불러내 현대 서구의 핵심 가치인 자유, 민주주의, 인권 담론의 강요가 가진 이중성을 폭로하는 것에 의해 이데올로기적으로 중국 리더십에 도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둘째, 대항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중국 내부와 외부의 자발적인 동의를 불러일으켜 비서구 국가인 중국이 미국 주도 질서에 도전하는 것에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다.
서발턴(Subaltern)과 역사적 블록(Historical Block): 그람시는 지배적인 정치체제에서 소외된 구성원을 서발턴으로 정의했는데 이때 서발턴은 노동자계급을 비롯해 체제가 생산하는 이익에서 배제된 모든 구성원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특정 시기 서발턴을 양산하는 사회조직, 경제구조, 이데올로기의 복합적인 배열형태를 역사적 블록으로 정의했는데 이는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의 다양한 제도와 이데올로기의 융합 작용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를 일컫는다. 중국은 작금의 국제정세를 국제적인 대변환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이 이 역사적인 전환의 시기에 미국 주도의 질서에서 소외된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주체라는 이데올로기를 전파하고 있다. 중국의 대항 이데올로기를 그람시의 문맥으로 해석한다면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배제된 개발도상국과 그 구성원은 서발턴으로, 그리고 이들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해 중국이 제시한 구체적인 로드맵인 글로벌안보이니셔티브(GSI), 글로벌발전이니셔티브(GDI), 글로벌문명이니셔티브(GCI)의 세 가지 구상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자주의 플랫폼인 상하이협력기구(SCO), 브릭스 플러스(BRICS Plus), 일대일로(BRI)는 역사적 블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동전(War of Maneuver)과 진지전(War of Position):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는 전략으로 그람시는 기동전과 진지전을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기동전이 혁명이 박두한 순간에 물리력을 동원해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라면 진지전은 결정적인 기회가 올 때까지 혁명 역량을 보호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개념을 미중 패권 경쟁에 적용한다면 기동전은 두 나라의 전면적인 혹은 부분적인 군사적 충돌을 의미한다. 하지만 군사적, 경제적으로 미국과 정면 승부를 겨루기에 역량이 부족한 중국은 진지전을 통해 국내적으로는 국력을 증강하고 국제적으로는 우군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진지전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국은 글로벌 사우스를 겨냥해 역사적 블록을 강화하는 다양한 구상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현대의 군주(Modern Prince): 그람시는 자본주의 체제의 역사적 블록을 혁파하고 기동전에서 승리해 노동자계급을 비롯한 서발턴을 해방하기 위한 가장 중차대한 과제로 ‘현대 군주’의 존재를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현대의 군주는 혁명을 주도할 전위정당을 의미하는 데 전위정당으로서 공산당의 중요성을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역설한 군주의 역할에 비유해 설명한 것이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당-국가체제이며 공산당의 당장이 국가의 헌법보다 상위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당 일당이 지배하는 정치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며 서구 민주주의의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국내 정책과 대외 전략은 모두 공산당 조직이 설계하고 집행한다. 이는 중국이 주도하는 미래의 국제질서가 곧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질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를 그람시적 문법으로 재해석하면 현재의 패권 경쟁은 미국이라는 국가와 중국 공산당의 대결이며 중국이 제공하는 각종 전략 구상과 플랫폼은 공산당이 경영하는 세계 질서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지점은 2023년 3월 중국이 제안한 글로벌문명이니셔티브의 발의 장소가 중국이 선별해서 초청한 개발도상국 정당들과의 회의 장소인 중국 공산당과 세계 정당 고위급 대화였다는 점이다. 문명이 사실상 안보와 발전을 모두 포괄한 상위개념이라는 점과 개발도상국의 문명이 글로벌 표준으로 수용될 만큼의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글로벌문명이니셔티브는 중국 공산당이 향후 패권 경쟁에서 중화문명의 가치와 역할을 전면에 내세우리라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 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수단인 그람시 이론의 핵심 개념을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그람시 이론의 중국 적용
결론
지금까지 사회주의 국가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 정책을 분석하는 도구로써 그람시 이론의 가능성을 시론(試論) 차원에서 간략히 살펴봤다. 주지하다시피 그람시 이론의 핵심은 억압이 아닌 동의에 기반한 지배,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데올로기가 수행하는 헤게모니 역할이다.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 그람시 이론을 통한 정치체제와 외교를 분석한 논문은 찾아볼 수 없다. 일부 영어 논문이 그람시 이론을 통해 중국 정치를 분석하고 있음에도 연구 영역이 중국 주도(공산주의와 소프트파워) 이데올로기와 제한된 시민사회 기능에 국한돼 있다. 그람시 이론이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체제에 대한 비판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존 연구에 아쉬움이 남는다. 반면 국제정치 영역에서는 그람시 이론을 활용해 패권국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개도국 엘리트의 역할3)이나 부상하는 중국이 대항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방안으로 개발도상국의 엘리트를 포섭하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 이 글은 미국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국내정치와 대외 정책 전반을 분석하는 틀로써 그람시 이론의 가능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 심화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초보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
*각주
1) Robert Cox. 1981. “Social Forces, States and World Orders: Beyond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illennium. Vol. 10. No. 2. pp. 128.
2) John Molyneux. Marxism and the Party. Chicago: Haymarket Books, 2003. pp. 141-160.
3) Robert Cox. 1983. “Gramsci, Hegemony, and IR: An Essay in Method”, Millenium Vol. 12. No. 2. pp. 162-175.
| 이전글 | 미·중 전략 경쟁에서 중국 민영기업의 향방: <민영경제촉진법>을 중심으로 | 2025-04-22 |
|---|---|---|
| 다음글 | 중국의 과학기술 수월성 교육: 에베레스트 계획, 중학생 영재계획, 기초강화 계획을 중심으로 | 2025-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