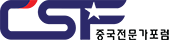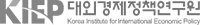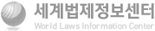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서구권]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초강수’...美 공급망 흔든다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4-18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은 희토류 산업을 1970년대 말부터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현재 글로벌 채굴의 61%, 가공의 92%를 담당하는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 2010년 이후 중국은 산업 통제를 강화하고 국유화를 추진하며 일본과의 영토분쟁 및 미국과의 무역갈등 과정에서 희토류를 전략적 외교카드로 활용함.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에 대응한 7종 희토류 수출제한은 미국 방위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에 직접적 타격을 주고 있음. 전문가들은 희토류의 중국 의존도를 단기간 내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함.
◦ 중국의 희토류 산업 발전과 독점적 지위
- 중국의 희토류 산업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발전은 1970년대 말부터 이루어졌음. 이 시기에 중국은 저렴한 노동력과 상대적으로 완화된 환경 규제를 바탕으로 외국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을 급속히 발전시켰음. 희토류 자원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덩샤오핑(Deng Xiaoping) 중국 전(前) 지도자의 1992년 내몽골 희토류 생산기지 방문 시 언급한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는 발언에서 여실히 드러남.
- 중국은 현재 글로벌 희토류 채굴의 61%, 가공의 92%를 담당하며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가공 단계에서 특히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음. 이러한 독점적 지위는 단순히 자원 보유뿐 아니라, 기술 개발과 자동화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그리고 정부의 산업 지원 정책을 통해 강화되었음.
- 2010년 이후 중국 정부는 희토류 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함. 특히 일본과의 영토분쟁 직후, 남부 롱난(Longnan) 지역의 사설 광산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국유화하는 과정을 거쳤음. 당시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기치 아래 불법 채굴과 밀수를 단속하고 산업 규제 권한을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이전함. 이후 이들 광산은 국유화되어 국유기업인 중국희토류그룹(China Rare Earth Group)으로 통합됨.
- 중국의 희토류 산업 구조 개편은 단순한 국내 산업 정비를 넘어 글로벌 공급망 장악을 위한 전략적 행보임. 국유화 이후 중국은 희토류 원자재 수출보다 자국 내 가공 산업 육성에 집중하며 가치사슬의 상류부터 하류까지 전 과정을 통제하는 체계를 구축함. 특히 간저우(Ganzhou) 지역을 중심으로 첨단 자석 생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했음.
- 중국은 희토류 분리와 가공에 있어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확보했으며, 이는 단기간에 다른 국가들이 따라잡기 어려운 수준으로 분석됨. 이러한 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 중국은 단순 원자재 공급국에서 벗어나 글로벌 첨단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 통제자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됨.
◦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전략과 사례
- 중국은 2010년 센카쿠/댜오위다오(Senkaku/Diaoyudao)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의 영토분쟁 당시 처음으로 희토류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함. 중국은 당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약 2개월간 중단하였으며, 이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심각한 원자재 부족 상황에 직면함. 비록 수출 중단 조치가 길지는 않았으나, 이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중국이 자국의 자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명확히 보여준 사례임.
- 2019년 트럼프 정부와의 첫 번째 무역 분쟁 당시 시진핑 주석은 중국 남동부 간저우의 희토류 자석 공장을 공식 방문해 희토류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선언함. 이는 미국에 대한 희토류 수출 제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되었음. 당시 방문 이후 중국은 희토류를 활용한 자석 생산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현재 세계 자석 생산의 90%를 점유하고 있음.
- 올해 4월 4일,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34%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부과에 대응하여 7종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함. 이번 조치는 사마륨(samarium), 가돌리늄(gadolinium), 테르븀(terbium), 디스프로슘(dysprosium), 루테튬(lutetium), 스칸듐(scandium), 이트륨(yttrium) 등 희토류를 대상으로 함. 새로운 규정에 따라 모든 기업은 해당 희토류 및 관련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함.
-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전략은 2023년 말 희토류 추출 및 분리 기술 수출 금지 조치로 더욱 강화되었음. 이는 단순히 원자재 공급을 통제하는 것을 넘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장기적 전략을 보여줌.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그레이슬린 바스카란(Gracelin Baskaran) 연구원은 "이는 자본 문제를 넘어선 기술 문제"라고 지적하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희토류 분리에 필요한 용매 추출 등 핵심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음을 강조함. 중국은 이러한 기술적 격차를 활용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에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비대칭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음.
◦ 중국 희토류 규제가 미국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미국 방위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음.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테슬라(Tesla), 애플(Apple) 등 많은 미국 기업들의 공급망은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음. 특히 미국 방위산업은 F-35 스텔스 전투기, 잠수함, 토마호크 미사일 등 주요 무기체계에 희토류 자석을 필수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미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F-35 전투기는 900파운드 이상,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은 약 5,200파운드,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약 9,200파운드의 희토류 원소가 소요됨.
- 현재 미국은 마운틴 패스(Mountain Pass) 광산이라는 유일한 희토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가공 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며 중희토류 분리 시설은 전무한 상황임.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미국은 모든 희토류 화합물과 금속 수입의 70%를 중국에 의존했다는 미국 지질조사국(USGS) 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미국은 희토류, 특히 중희토류 공급에 있어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미국의 방위산업이 이미 제한된 생산능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희토류 제한 조치는 이 격차를 더욱 넓힐 것이라고 경고함.
-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글로벌 공급망에도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희토류 자석 컨설팅 회사 JOC의 설립자 존 오머로드(John Ormerod)에 따르면, 이미 최소 5개의 미국 및 유럽 기업들의 희토류 자석 출하가 중국에서 중단되었음. 중국 정부가 새로운 수출 라이선스를 발급해 선적이 재개되더라도 적어도 45일의 출하 지연이 예상된다는 분석도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 모색에 나서고 있으나 단기간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임.
- 컨설팅 기업 호라이즌 자문(Horizon Advisory) 공동 설립자인 네이슨 피카식(Nathan Picarsic)은 "중국은 기꺼이 상황을 악화시킬 의향이 있다"며 이번 희토류 제한 조치는 “미국과의 반복적인 협상 게임에서 첫 단계일 뿐”이라고 우려함. 캐피탈 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의 닐 쉬어링(Neil Shearing) 수석 경제학자는 희토류와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는 중국이 미국에 맞서는 주요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함.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중국의 독점적 지위를 대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함.
[참고 자료]
| 이전글 | 중국, 의약품·의료기기 혁신 지원정책 강화 | 2025-04-18 |
|---|---|---|
| 다음글 | 中 탄소시장, 종합 거래 플랫폼으로 진화...철강·시멘트·알루미늄 품는다 | 2025-0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