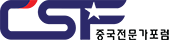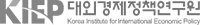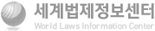전문가오피니언
Home 전문가오피니언
주요 이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견해 및 제언이 담긴 칼럼을 제공합니다.
중국 농민공의 유동(성)과 노동정치
정규식 소속/직책 :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 연구교수 2025-05-13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하는 농민공: ‘새로운 노동대군’과 ‘신시민’의 경계
개혁개방 이후 중국 체제전환의 핵심 영역 중 하나는 사회구조의 변화이며, 거대한 유동인구로 대표되는 농민공이 항상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있었다. 그리고 2024년 현재 이제 약 3억 명에 달하는 중국 농민공은 이미 단일한 범주가 아니다. 고용형태, 노동조건, 기술 수준, 교육 수준, 민족, 소득, 연령, 성별, 출신지, 가족 구성 등에 따라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인식이나 문화적 정체성도 상이하다. 더욱이 산업구조의 변화나 기술 발전, 그리고 국가 발전전략 및 담론의 전환에 따라 농민공이 처한 조건과 상황은 언제나 ‘유동적’이다.1)
무엇보다 개혁개방이 본격화된 1978년부터 1988년까지의 ‘험난한 유동’의 시기와 1989년부터 2002년에 이르는 ‘농민공 열풍’의 시기를 거쳐 2003년부터 현재에 이르는 ‘신공민(신시민)’의 시기까지 중국 농민공은 농촌과 여러 도시(들)의 경계에서 계속 유동하며 살아가고 있다(려도, 2017; 2018). 그리고 농촌에서 도시로의 이주라는 물리적 유동성과 함께 이들에 대한 호명과 그에 따른 담론 및 인식 체계도 계속 유동하고 있다(완닝순, 2024). 1980-90년대 주류 미디어는 이들을 정처 없이 도시를 떠도는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인식하면서 ‘맹목적 유동인구’(盲流)로 불렀으며, 2006년 국무원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사회문제로 격화하는 것을 사회안정의 위협으로 인식하면서 마침내 농민공을 “중국의 개혁개방과 공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출현한 새로운 노동 대군”으로 인정했다(中国国务院研究室课题组, 2006).
그러나 농민공에 대한 인정은 대체로 경제적 공헌의 측면에서 상징적인 차원에만 머무를 뿐, 이들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차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농민공에 대한 제도적 차별을 합법화했던 도시-농촌 호적 구분에 따른 신분적 질서를 완화하기 위해 최근 여러 지역에서 도시 호구 등록 요건을 하향 조정하거나 아예 통폐합하기도 했으며,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사회보험과 공공서비스를 확대하는 정책들도 꾸준히 시행되고 있지만, 사회문화적 자본이 부족한 농민공들이 ‘시민’으로서의 제도적 성원권을 갖기란 여전히 요원한 일이다.
이처럼 ‘농민공’이라는 호명과 ‘새로운 노동 대군’이라는 인정 사이에는 간단히 넘을 수 없는 유무형의 벽이 존재한다. 농민공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들에게 도시에서 안정적으로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보다는, 그 사회적 재생산 비용을 농촌에 전가함으로써 도시에 저임금 노동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 정부와 사회가 기대하는 농민공은 “농촌을 벗어나 떠돌아다닐 ‘자유’와 일터에 자신을 귀속시킬 ‘책임’, 언젠가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갈 것이라는 ‘약속’에 서명한 자들”일 뿐이다(조문영, 2009: 8).
‘과객’이라는 담론의 허구성과 도시에서 늙어가는 농민공
중국 정부와 사회의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는데 매우 유용한 담론 중 하나가 바로 농민공을 언젠가는 농촌으로 돌아갈(혹은 돌아가야 할) ‘과객(过客)’으로 바라보는 인식이다(汪建华·黄斌欢, 2014). 여기에는 현재 농민공들이 영위하는 도시에서의 노동과 삶은 임시적일 뿐, 그들이 원하면 언제든 고향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는 시각이 깔려있다. 대표적으로 허쉐펑(賀雪峰)은 농민공들이 도시로 나가 일을 함으로써 중국의 농가는 임금소득과 농업소득을 동시에 얻을 수 있었기에 “농촌이 중국 현대화의 안전판이자 저수지로 기능”할 수 있었고, 또 “낮은 비용으로도 높은 품질의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으며, 농민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중국식 도농 이원구조의 특수성이며, “중국 사회가 안정을 유지하면서도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고, 세계화의 조류 속에서도 자기 이익을 획득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강조한다(허쉐펑, 2017: 35-42).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2008년 말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발생한 2,000만 명의 농민공 실업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 문제가 아닌 “조금 빨리 시작된 세대별 분업의 교체”일 뿐이며, 농민공의 임금소득이 존재하기만 하면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농민공은 도시에서 실패하면 언제든 농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기에 빈민굴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논리로 이어진다(허쉐펑, 2017: 30-40). 더욱이 이 논리는 농민공들은 유동적 성격 탓에 집단적인 저항이나 권리 의식이 형성되기 어렵기에 ‘반(半)프롤레타리아화’나 ‘계급 실어증’ 상태에 있다는 인식으로 강화된다(Pun & Lu, 2010).
그러나 1990년대에 이미 1억 명을 돌파했던 농민공은 이제 3억 명에 육박한 거대한 집단으로 현재까지도 계속 세대를 이어 도시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중국 노동운동의 주역으로 관심을 모았던 신세대 농민공(1980년대 이후 출생한 농민공)들은 취업 기회와 생활환경의 불안정성, 결혼 전망 및 도시 소속감 측면에서의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계속 남아있다. ‘조화사회’로부터 ‘농민공의 시민화’, 그리고 ‘공동부유’의 실현이라는 정부의 정책 및 수사적 담론은 계속 진화하고 있지만, 농민공들은 이를 누리기도 전에 이미 도시의 공장 기숙사나 건축현장의 임시숙소 혹은 낡고 비좁은 셋방에서 늙어가는 것이다.
농민공의 강제된 유동성과 노동정치
한편 농민공들의 이러한 유동(성)은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라는 자본 및 시장의 논리에 의해 강제된 것이라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최근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건설을 위해 전통적인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을 탈피해, 과학기술과 혁신에 기초한 ‘새로운 질적 생산력’(新质生产力)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즉 전통 산업의 구조전환과 업그레이드를 강화하고 여기에 인공지능, 디지털 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의 전략적 신흥 산업을 육성하여 미래산업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경유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그동안 중국에 과도하게 의존하던 기존 산업공급망을 탈피하기 위해 공급망 분산을 가속화 하면서 중국 제조공장에 대한 주문이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도와 베트남 등의 동남아나 중국 내륙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중국 연안 지역에 밀집한 저가형 글로벌 제조공장에서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감원이 대거 실행되고 있으며, 수십만 명 이상의 농민공을 고용하고 있는 폭스콘과 같은 일부 기업에서는 이를 위한 목적으로 강제적 직무조정이나 전근, 연장근로 축소, 희망퇴직 강요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2) 더욱이 중국 정부도 이를 ‘산업 고도화’라는 명목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저가형 제조산업의 이전과 디지털 산업으로의 전환 등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부 연안 지역에서 일하던 농민공 상당수가 원래의 일자리와 집에서 저임금을 받는 내륙지역으로의 이동이 강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강제된 유동성으로 인해 고용 불안정과 빈곤에 내몰린 농민공들의 분노가 새로운 저항의 물결로 이어지고 있다. 즉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에 따른 전통 산업의 파산과 기업 이전 및 경영난의 부담이 주로 노동자들에게 전가되면서 임금체불, 사회보험료 체납, 해고보상 회피, 희망퇴직 강요 등으로 인한 파업과 집단행동이 폭증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노공통신(CLB)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중국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은 총 1,794건이 접수되어 작년(831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주로 농민공들이 많이 종사하고 있는 건설업(52.9%)·제조업(24%)·서비스업(11.7%)·교통물류업(6.4%) 등의 전통 산업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3) 그리고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의 산업구조 전환으로 인해 발생한 농민공 실직자들이 온라인 플랫폼 기반의 운수 및 물류와 택배, 배달업으로 대거 몰리면서 만성적인 임금 체불이나 가혹한 노동조건에 항의하는 파업과 시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이윤을 좇아 발 빠르게 움직이는 ‘자본’의 뒤에는 항상, 어디로도 쉽게 갈 수 없는 ‘노동(자)’이라는 문제가 남는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자가 아닌 오히려 자본이 ‘과객’이다. 더욱이 중국 노동체제의 형성과 변화의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유동성을 지닌 ‘과객’으로 치부되었던 농민공들의 시위와 저항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의 변화 및 법·제도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했다. 예컨대 1993~1994년 파업은 노동법 시행을, 2004~2005년 파업은 2007년 노동계약법 제정을, 그리고 2010년 파업은 파견노동자에 관한 노동계약법 개정을 촉진했다(정규식, 2019: 77). 따라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라는 거센 물결에 떠밀려 ‘남아있을 수 없는 도시’와 ‘돌아갈 수 없는 농촌’ 사이에서 이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또 유동해야 하는 농민공들이 어떠한 ‘저항의 정치’를 만들어갈지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 변화가 어떤 양상을 보일지도 중국 노동정치의 동학을 이해하는데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
*각주
1) 따라서 정치경제적 전환이나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규정되고 재배치되는 농민공의 특성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노동과 문화 및 생활세계가 빚어내는 복잡성을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유동하는 중국 농민공: 노동·문화·삶-정치적 분석을 위한 시론”(정규식, 2025)이라는 필자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으며, 이 글은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논문의 일부 내용을 축약하여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이러한 폭스콘의 정책은 일선 노동자들 사이에서 ‘랑화’(浪花) 프로젝트로 불리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 3월 당시 해외 주문량 감소와 제조단가 인하에 따른 경영압박을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방안으로 처음 도입되었으며,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도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3) 中国劳工通讯, “2023年中国工人抗议纵览: 资本逃窜乱涌 工人集体行动较上年翻倍”,
https://clb.org.hk/zh-hans/content/2023
[참고문헌]
려도 지음, 정규식 외 옮김, 『중국 신노동자의 형성: 도시와 농촌 사이에서 길을 찾는 사람들』, (서울: 나름북스, 2017).
려도 지음, 정규식 외 옮김, 『중국 신노동자의 미래: 변화하는 농민공의 문화와 운명』, (서울: 나름북스, 2018).
완닝 순 지음, 정규식 옮김, 『서발턴 차이나: 농민공과 미디어 그리고 문화적 실천』, 비매품(부산: 산지니, 2024)
정규식, 「유동하는 중국 농민공: 노동·문화·삶-정치적 분석을 위한 시론」, 『현대중국연구』, 2025년 제26권 제4호, 『노동으로 보는 중국』, (서울: 나름북스, 2019).
조문영, 「중국 경제 위기 속 농민공 대량실업을 바라보는 시각」, 『쌀·삶·문명 연구통신』, 2009년 1집
허쉐펑 지음, 김도경 옮김, 『탈향과 귀향 사이에서: 농민공 문제와 중국 사회』, (서울: 돌베개, 2017).
国家统计局, <2015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 2016년 4월 28일. http://www.stats.gov.cn/tjsj/zxfb/201604/t20160428_1349713.html (검색일: 2016년 11월 16일).
国家统计局, <2023年农民工监测调查报告>, 2024년 4월 30일. https://www.stats.gov.cn/sj/zxfb/202404/t20240430_1948783.html (검색일: 2025년 2월 13일).
汪建华·黄斌欢, 「留守经历与新工人的工作流动: 农民工生产体制如何使自身面临困境」, 『社会』2014年 第34卷.
中国国务院研究室课题组, 『中国农民工调查报告』, 中国言实出版社, 2006年
中国劳工通讯, “2023年中国工人抗议纵览: 资本逃窜乱涌 工人集体行动较上年翻倍”, https://clb.org.hk/zh-hans/content/2023 (검색일: 2024년 11월 18일).
Pun,Ngai & Lu,Huilin,“Unfinished Proletarianization: Self, Anger and Class Action among the Second Generation of Peasant-Workers in Present-Day China”, Modern China, Vol. 36, No. 5, 2010.
| 이전글 | 트럼프 2.0 시대, 대만국민의 대외 인식 ― 대만민의교육기금회(TPOF) 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2025-05-19 |
|---|---|---|
| 다음글 | [차이나인사이트] 금융 5대 과제 수행으로 신질생산력 발전 지원 | 2025-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