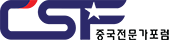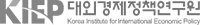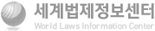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정책·자본·기술’ 삼중 엔진 장착한 中 저고도 물류 산업
유은영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6-27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국 저고도 물류 산업은 정책, 자본, 기술의 삼중 동력에 힘입어 급성장하며 2023년 500억~600억 위안에서 2025년 1,200억~1,500억 위안으로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될 전망임. 드론 제조업체, 물류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간 삼각 경쟁 구조가 형성되며 전통적 물류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음. 상업화를 위해서는 항공 교통관제 복잡성, 인프라 부족, 경제성 확보 등 핵심 과제 해결이 필요하나, 각 지방정부의 실증사업과 산업펀드 조성 등으로 기술 성숙과 시장 확산 단계로 전환되고 있음.
◦ 저고도 물류 산업 생태계 형성과 시장 급성장
- 중국 저고도 물류 산업이 정책, 자본, 기술의 삼중 동력에 힘입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특히 2024년 '저고도 경제(低空经济)'가 중국 정부업무보고에 처음 명시되면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산업 발전에 강력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음.
- ‘저고도 경제(低空经济)’는 유·무인 항공기의 다양한 저고도 비행 활동을 중심으로 관련 분야의 통합적 발전을 견인하는 종합적 경제를 의미함. 고도 1,000m 이하 공역(空域)에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저고도 경제’라고 명명함. ‘저고도 물류’는 드론, eVTOL(전기 수직이착륙기) 등을 통해 저고도 공역에서 이루어지는 물류 배송을 의미함.
- 시장 규모 측면에서 중국 저고도 물류 시장은 2023년 500억~600억 위안(약 9조 4,465억~11조 3,358억 원)에서 2025년 1,200억~1,500억 위안(약 22조 6,680억~28조 3,395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연평균 37% 이상의 고성장률을 기록하며 저고도 경제의 폭발적 성장세를 입증하고 있음. 또한 물류 드론 시장만으로도 2030년 1,500억 위안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 성장 동력이 충분한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성장세는 구체적 지표로 확인됨. 2023년 전국 민간 드론 등록 대수가 126만 7,000대로 전년 대비 32.25% 증가했으며, 2024년에도 110만 3,000대가 신규 등록되며 업계의 활발한 투자와 확장이 지속되고 있음. 인프라 측면에서도 전국 일반 항공 공항이 2024년 말 기준 496개로 늘어나며 저고도 물류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고 있음.
- 항로 개통 현황을 보면 2024년 말까지 중국 전역에 140여 개의 신규 저고도 물류 항로가 개설되어 베이징(北京), 선전(深圳), 청두(成都)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고 있음. 순펑홀딩스(顺丰控股), 쉰이과기(迅蚁科技) 등 물류 부문 선도 기업들이 정규 운영 체제로 전환하며 연간 백만 건 규모의 배송 실적을 달성해 상업적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음.
- 산업 생태계는 드론 제조, 운영, 항공 교통관제 서비스, 최종 배송에 이르는 완전한 밸류체인으로 발전하고 있음. 업스트림 분야에서는 더싸이전지(德赛电池), 신왕다(欣旺达) 등 핵심 부품업체가, 미들스트림 분야에서는 DJI, JOUAV 등 드론 제조사가,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는 순펑, 징둥(京东), 메이퇀(美团) 등 물류·전자상거래 기업이 각각 전문 영역에서 핵심 역량을 구축하고 있음.
◦ 신규 진입 업체와 전통 물류 생태계의 구조적 재편
- 저고도 물류 산업에서는 물류 기업, 전자상거래 플랫폼, 드론 제조업체 간 삼각 경쟁 구조가 형성되며 각기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고 있음. 전통적 물류 기업들은 기존 배송 네트워크와의 시너지 창출에 주력하며 운영·관리 시스템과 육상·항공 연계 체계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은 고객 경험과 데이터 활용을 중시하며 배차 알고리즘, 운송 역량 통합, 옴니채널 물류 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음.
- 드론 제조업체들은 플랫폼 기반 전략을 채택해 비행제어 안전, 통신 시스템 등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단순 하드웨어 공급업체에서 종합 솔루션 제공업체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음. 이는 저고도 물류가 단순한 운송 수단의 다양화가 아닌 물류 네트워크 주도권을 둘러싼 경쟁임을 시사함.
- 기존 택배 물류 기업들이 보관·운송·배송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했던 폐쇄형 공급망 구조가 해체되고 있음. 저고도 물류에서는 항공기 제조, 항공 교통 관제, 플랫폼 운영, 안전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면서 IT기업들이 알고리즘, 플랫폼, 시스템 통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핵심 밸류체인에 진입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순펑홀딩스는 선제적 시장 진입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업계 표준 제정에 참여하며 인프라 공동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징둥은 전략적 투자 유치로 드론 자회사를 설립하며 비즈니스 모델 혁신과 플랫폼 서비스 확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메이퇀은 올해 초부터 해외 진출을 본격화해 두바이를 드론 배송 첫 해외 실증 지역으로 선정하고 2~3개 노선 신설을 계획하고 있음.
- 기술 혁신 측면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음. 쉰이과기는 항공 데이터 기반 '톈투(天图)' 시스템을 구축해 도시 핵심 구역 드론 운항 데이터와 도시 전체 빅데이터를 융합한 '저고도 스마트시티' 플랫폼을 개발했음. 드론 업체 이항(EHang)은 자체 개발한 ‘EH216’ 시리즈 유인 자율비행기를 활용해 다수 도시의 저고도 물류와 도시항공교통(UAM)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지역별 저고도 물류 산업 전략도 구체화되고 있음. 광둥-홍콩-마카오(粤港澳)가 산업클러스터 효과로 전국을 선도하는 가운데, 선전은 소비자용 드론 시장의 압도적 점유율을 바탕으로, 광저우는 eVTOL 연구개발에 특화하며, 주하이(珠海)는 에어쇼를 활용한 항공산업 융합에 주력하고 있음. 장강삼각주(长三角)와 촨위(川渝) 지역도 투자를 확대하며 다양한 발전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저고도 물류의 본격적 상업화를 위한 선결과제
- 저고도 물류의 본격적 상업화를 위해서는 3대 핵심 과제 해결이 필수적임. 우선 항공교통 관제의 복잡성 문제로, 중국의 저고도 공역 개방이 진행 중이나 비행 승인 절차와 공역 설정 기준의 표준화가 미완성 상태임. 둘째는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이착륙장, 충전시설, 항공기지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노선 확장을 제약하고 있음. 셋째는 사회적 수용성 문제로, 비행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이용자들의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성 확보도 대중화의 현실적 걸림돌임. 고성능 물류 드론 1대의 구입 비용이 수십만 위안에 달하고 운영비를 합하면 총 비용이 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익 모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상황임. 비용 경쟁력 확보의 핵심은 규모의 경제 달성과 기술 혁신에 있음. 네트워크 운영 효율화, 항로 최적화, 표준화된 항공기 인증 절차 도입을 통해 운영비를 절감하는 한편, 드론 추진 시스템의 경량화와 모듈화 설계로 구매 및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대응해 중국의 각 지방정부는 실증사업,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선전은 2026년까지 1,200개 이상의 저고도 이착륙장 건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베이징, 쓰촨, 구이저우(贵州) 등은 '저고도 경제 특구' 시범 운영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고 있음.
-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도 확대되고 있음. 2024년 이후 전국 각지에서 저고도 경제 전용 산업펀드 조성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규모는 최대 200억 위안(약 3조 7,814억 원)까지 다양함. 이러한 펀드는 선도 기업, 연구기관, 협력업체 간 상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기업들의 조기 수익화를 뒷받침하고 있음.
- 중국 저고도 물류 산업의 발전 경로는 정책 주도와 기업 실증 단계에서 기술 성숙, 인프라 완비, 시장 확산의 다면적 성장으로 전환되며 일반 소비자 대상 서비스로 확산되고 있음. 특히 미래 물류 시스템이 기존의 지상 운송 중심에서 육상·항공이 통합된 입체적 물류 네트워크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됨.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 이전글 | 스타벅스, 中 로컬 브랜드 질주에 입지 ‘흔들’ | 2025-06-27 |
|---|---|---|
| 다음글 |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BCI 강국 부상 | 2025-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