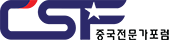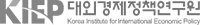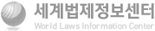이슈 & 트렌드
Home 이슈 & 트렌드
경제, 정치·외교,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주요 이슈에 대한 동향을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홍콩, 글로벌 자산관리 허브로 부상...패밀리오피스 2700개 돌파
안희정 소속/직책 : EC21R&C 연구원 2025-07-25
자료인용안내
자료를 인용, 보도하시는 경우, 출처를 반드시 “CSF(중국전문가포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콩이 글로벌 자산관리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 아시아 경제성장과 서구 부유층의 아시아 이주, ‘일국양제’ 기반의 독특한 제도적 우위가 성장을 견인하고 있으며,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와 가상화폐 ETF, ESG 투자 등 금융혁신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향후 중국 본토와의 금융 연결성 고도화, 신흥시장 개척, 차세대 금융기술 선점이라는 핵심 과제 해결을 통해 국경간 자산관리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홍콩 자산관리 시장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 홍콩이 글로벌 자산관리 허브로 부상하고 있음. 홍콩 증권선물위원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홍콩의 자산관리 규모는 35조 1,000억 홍콩달러(약 6,142조 원)로 전년 대비 13% 증가했음. 이는 홍콩이 전통적 라이벌인 싱가포르를 압도하고 세계 1위 스위스와의 격차를 급속히 좁히고 있음을 의미함.
- 이와 같은 홍콩의 성장은 크게 세 가지 구조적 요인에 기인함. ▲첫째, 아시아 지역의 경제성장과 부의 집중 현상임. 스위스 줄리어스베어(Julius Baer)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24년 경제성장률 4.5%를 기록하며 세계 평균 3.3%를 크게 상회하였음. 특히 중국과 인도의 지속적 성장에 힘입어 2025~2028년 전 세계 신규 부유층의 47.5%가 아시아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역내 자산관리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함.
- ▲둘째, 서구 부유층의 아시아 이주 가속화임. 영국 헨리앤파트너스(Henley & Partners) 조사에 따르면, 2025년 영국에서는 1만 6,500명의 부유층이 해외로 이주하는 반면 홍콩은 800명의 순유입을 기록해 세계 10위권에 진입함. 이는 유럽과 미국의 상속세 인상 및 증세 정책에 부담을 느낀 부유층들이 저세율 지역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있기 때문임. UBS 조사에서도 부유층 응답자의 53%가 경기침체를, 46%가 세금 인상을 주요 투자 위험으로 꼽은 것이 이를 뒷받침함.
- ▲셋째, 홍콩만의 독특한 제도적 경쟁 우위임. '일국양제(一国两制, 한 국가 두 체제)' 를 바탕으로 중국 본토와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유일한 금융 관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자유로운 자본 이동과 안정적인 달러 연동 환율제로 국제 자본에 안전한 투자처를 제공함. 특히 2019년 정치적 혼란 이후 국가보안법 제정으로 정치적 안정을 되찾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대되는 글로벌 환경에서 홍콩의 '안전 피난처' 기능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 홍콩 정부의 정책 혁신과 제도적 기반 구축
- 홍콩 정부는 자산관리업 육성을 위해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음. 이는 크게 외국인 투자 유치, 금융상품 혁신, 세제 지원의 세 축으로 구성됨. 먼저 외국인 투자 유치 정책에서는 '신자본투자자 입국계획(新资本投资者入境计划)'이 성과를 거두고 있음. 2024년 3월 시행 이후 11월까지 700건 이상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는 210억 홍콩달러(약 3조 6,747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입할 것으로 예측됨.
- 가족자산관리회사인 패밀리오피스(Family Office) 유치 정책도 성과를 보임. 2023년 말 기준으로 홍콩에는 2,700개 이상의 패밀리오피스가 설립되었으며 이는 싱가포르의 거의 2배 규모임. 홍콩 패밀리오피스 중 절반 이상이 5,000만 달러(약 686억 원) 이상의 대형 자산을 다루고 있어 질적 수준도 매우 높음.
- 금융상품 혁신 분야에서 홍콩은 글로벌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2024년 4월 아시아 최초로 가상화폐 현물 ETF 6종이 홍콩거래소에 상장되었는데, 이는 미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사례로 홍콩의 금융 혁신 역량을 보여줌. 중국계 자산운용사들이 주도한 이번 상품 출시는 홍콩이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을 연결하는 핵심 허브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함. 현재 홍콩은 7개 가상화폐 거래소에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하여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음.
-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분야에서도 홍콩은 아시아 녹색금융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잡음. 2023년 3월 기준 홍콩에서 승인된 ESG 펀드는 224개에 달하며 운용 자산은 1,700억 달러(약 233조 원)를 넘어섰음. 또한 녹색채권 발행을 위해 2억 5,000만 홍콩달러(약 437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며, 관련 채권 총액은 1,200억 달러(약 164조 8,440억 원)에 달하였음. 이는 홍콩이 자본 유치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금융생태계 구축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줌.
- 기술 혁신 분야에서는 홍콩금융관리국의 '앙상블(Ensemble) 프로젝트'가 주목됨. 이 프로젝트는 부동산, 탄소배출권, 채권 등 실물자산의 디지털화를 통해 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을 통한 결제 시스템 혁신과 함께, 홍콩을 차세대 금융기술의 실험장이자 상용화 중심지로 만들어가고 있음.
◦ 향후 발전 과제와 글로벌 금융허브로의 전망
- 홍콩이 글로벌 자산관리 패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핵심 과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해야 함. ▲첫 번째 과제는 중국과의 금융 연결성 고도화임. 2024년 11월로 후강퉁(沪深港, 상하이-홍콩 주식 연결) 제도 도입 10주년을 맞아 다양한 개선책이 시행되고 있음. ETF 상품 확대, 스왑 거래 서비스 도입 등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부동산투자신탁(REITs) 편입과 위안화 거래 확대가 예상됨. 특히 2025년 1월부터 시행된 펀드 상호인정 제도(MRF) 2.0은 중국 투자자들의 해외 자산 배분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
- ▲두 번째 과제는 신흥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 동력 다각화임. 홍콩은 기존 유럽, 미국 시장 기반을 유지하면서 동남아시아, 중동 등 고성장 지역으로의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증권거래소에 홍콩 주식 투자 ETF가 상장된 것은 중동 지역과의 금융 협력 확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임. 이 상품은 중동 최대 규모의 ETF로, 홍콩에 중동 자금을 유입시키는 동시에 사우디 자본시장 발전에도 기여하는 상생 모델을 제시함. 향후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 부유층 확산 지역으로의 체계적 진출이 홍콩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임.
- ▲세 번째 과제는 차세대 금융기술 선점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임. 2024년 10월 홍콩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은 금융업계의 AI 도입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함. 현재 다수 자산관리회사들이 AI 기반 데이터 분석, 위험 관리, 고객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있음.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한 실물자산 토큰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활용 등 혁신적 금융서비스 개발이 홍콩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임.
- 이러한 과제 해결을 통해 홍콩의 장기 전망은 매우 밝음. 블룸버그 산업연구에 따르면, 홍콩의 개인자산관리 규모는 향후 6년 내에 현재의 거의 2배인 2조 3,000억 달러(약 3,159조 5,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스위스를 제치고 세계 최대 국경간 자산관리 중심지로 부상함을 의미함.
[관련 뉴스 브리핑]
[참고 자료]
| 이전글 | [차이나인사이트] 6월 CPI 플러스 전환, PPI 새로운 저점의 배경 | 2025-07-31 |
|---|---|---|
| 다음글 | 中 정부, 외자유치 위한 정책패키지 단계적 추진 | 2025-07-25 |